이용이 소설 '각시붕어'
근정전 앞마당은 조정이라 부르고, 박석을 깔아 임금의 즉위식과 문무백관을 품계석 뒤로 세워 의식을 거행하였다. 외국 사신을 맞는 등 정사를 돌보던 곳이기도 했다.
내부에는 널따란 마루위 중앙에 붉은 색칠을 한 단을 높이 쌓아 임금이 앉을 좌대를 만들고, 보개 천정에 어우러진 황룡(칠조룡)조각과 봉항무늬로 현란하게 장식되었다.
옛날의 화려한 놀이 흘려보내고, 연못에서는 잉어만 쓸쓸하게...
다음에는 그 뒤에 있는 왕의 침전인 강녕전과 뒤에 있는 왕비의 침전인 교태전을 구경했다. 외국 사신의 접대와 연회를 베풀었던 경회루로 가보니 앞면 7칸, 옆면 5칸의 중층 건물이었다. 팔작지붕의 이 건물은 장대석 기단위에 커다랗게 지어져 있었다.
경회루는 옛날의 화려한 놀이를 흘려보내고, 앞의 연못에서는 잉어만 놀고 있는 모습이 쓸쓸함을 더해주어 '경복궁 엘레지'란 시를 지어 외로운 마음을 달래주었다.

'경복궁 엘레지'
추녀 끝에 매달린
굽이굽이 조선 오백년
허공을 이고서서
수절하며 묵묵히 지켜온 경복궁
연초록치마 갈아입은 정원
통한의 역사 안은 아름드리 소나무
새들은 잃어버린 왕가의 얼이 된 듯
구슬프게 울어 대고
바람처럼 흘러간 무심한 세월
눈물 감춘 상제나비 되어
동그만 뜨락의 자목련 찾아
휘적휘적 날고 있네
아름다워라, 석양의 노을치마 속
드넓은 뜨락에 피어난
켜켜이 쌓인 민초들의 애환
시로 달래주는 경복궁 엘레지
그리고 대비전인 자경전, 함화당과 집경당을 지나 국립민속박물관 관람 후에 후원 정자인 향원정, 집옥재와 팔우정, 협길당 등을 둘러보고, 건춘문 앞 잔디위서 휴식을 취한 후에 밖으로 나갔다. 서울에서 맛이 있다고 소문이 난 삼청동 총리공관 밑에 있는 감자수제비 집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북촌마을길을 따라 비원 정문으로 향했다.
예로부터 북촌은 조선시대의 양반동네로 알려져 있었다. 이곳 주택은 모두 기와집으로 상류층의 구조 형태를 간직하며, 잘 보존되어 외국의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다. 원서동, 재동, 계동, 가회동, 인사동으로 구성된 이 지역은 청계천과 종로의 윗 동네라는 뜻에서 북촌이라 했다. 지금은 전통문화체험관, 한옥음식점, 한복체험관 등으로 활용되어 간접적으로 조선시대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곳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조선 왕궁의 조원 중 가장 아름답다는 비원을 구경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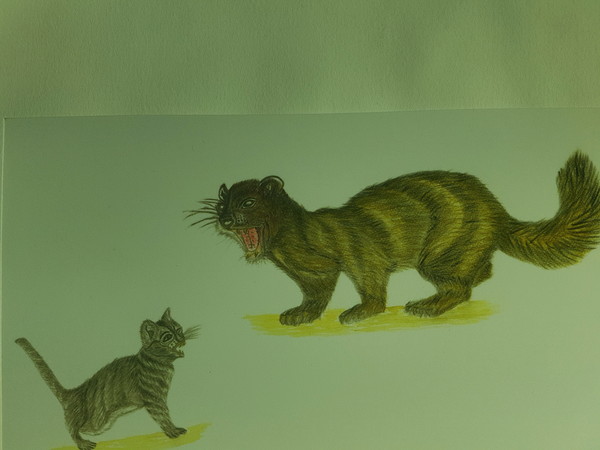
북촌길을 지나 조선 태종5년에 지어져 광해군 때부터 정궁으로 사용되었고, 조선시대에 건축된 5대 궁궐가운데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다는 창덕궁으로 갔다. 창덕궁은 창경궁에 이어져 있고, 궁 뒤쪽에는 조선왕궁의 대표적인 조원유적으로 알려져 있다. 1997년 창덕궁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비원이 있다.
정문인 돈화문을 들어가 금천교를 지나가니, 정전의 정문인 인정문은 양쪽의 월랑이 디귿자로 감싸고 있었다. 마당 안의 임금이 걷는 길을 걸어가면 인정전이 맞아주었다. 창덕궁에 있는 인정전, 돈화문, 인정문, 선정전, 대조전, 선원전, 대조전, 선원전 등을 구경하고, 북쪽에 위치한 조선 왕궁의 조원 중 가장 아름답다는 비원으로 향했다.
비원은 북한산의 한 줄기인 매봉을 등지고, 자연의 지세에 따라 정자와 연못을 배치하였다. 곳곳에서 차고 맑은 샘물이 솟아나 서쪽 담 안으로 흐르는 계류는 금천교 밑을 지나 남으로 흐르고, 비원 동북쪽에 있는 옥류천 물은 동쪽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땅 밑에서 솟아나는 샘물들은 반드시 애련지, 부용지를 모두 채우고, 다시 넘쳐흘러 창경궁 춘당지에 들었다. 모여든 물들은 창경궁 안쪽으로 흐르다가 남쪽으로 나갔다.
현재에 남아 있는 연못은 부용정이 있는 부용지, 애련정이 있는 애련지, 연경당 앞의 장방지, 몽답정 앞의 장방지, 존덕정 앞 반월지, 관람정 앞 반도지, 옥류천 주위의 청의정이 있는 소형의 못들이 연이어있었다. 태극정 앞에 있는 소형의 연못 안에는 연꽃을 심고 물고기를 길렀으며, 부용지와 애련지에는 놀이배를 띄워 낚시질도 했다.
그리고 비원에는 300년을 넘게 살았다는 느티나무, 은행나무, 회화나무, 주목, 밤나무, 측백나무, 매화나무, 향나무, 다래나무, 주엽나무, 살구나무 등이 자라고 있었다. 또한 수령이 100년 이상으로 추정되는 느티나무, 은행나무, 다래나무 등이 힘차게 뻗어 나갔다. 관상수는 인공적으로 심지 않았고 전지를 하거나 꽃밭도 만들지 않았다.
보는 이의 마음에 슬픈 역사를 뒤돌아보게 하는 것들

비원의 괴석들은 정자나 건물의 주위에 단을 지어 만든 공간에 배치되었다. 괴석의 형태는 기이한 바위나 선산의 형태로 수성암이나 현무암의 종류를 많이 사용하였다. 괴석을 받쳐 놓은 대는 화강암으로 팔각형, 원형, 육각형, 등 여러 모양을 만들었다. 대석위에는 사자 등 다양한 동물을 새긴 것과 꽃무늬를 새긴 것들을 만들어 놓았다.
괴석을 쳐다보고 있노라니, 괴석에서 어여쁜 왕비와 왕이 손을 잡고 걸어 나와 아름다운 후원 길을 거닐며 담소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 연기처럼 아련히 스쳐 지나갔다.
연경당 안 마당가에는 수련과 같은 수초를 길렀던 석조가 남아있었다. 후원 안에 남아 있는 건물들은 누각, 정자, 민가양식 등인데 집모양도 사각형, 육각형, 팔각형, 다각형 등으로 다양하고 기발한 착상과 함께 목공예의 정교한 솜씨를 보여주고 있었다.
비원은 느긋하고 여유로운 공간이며, 스스로 넉넉함을 느낄 수 있는 수양지이고 학업 수련의 장이기도 했다. 이렇게 호화롭고 아름다웠던 넓은 마당은 주인을 잃고, 산비둘기만 한가롭게 거닐고 있었다. 그 곁에는 청솔모와 다람쥐 한 쌍이 먹을 것을 달라고 관광객들을 따라 다니고 있어, 보는 이의 마음에 슬픈 역사를 뒤돌아보게 했다.(계속)
/이용이 작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