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근의 지리산 문화대간(94)
메주를 만드는 철이다. 이맘때 쯤 생겨났던 어릴적 추억 하나는 가마솥에서 콩을 삶아 메주를 만들때 메주거리를 먹고 나서 삶은 콩을 절구통에 넣고 찧는데 나섰던 일이다.

어머니는 콩을 잘 씻어서 불렸다가, 가마솥에 넣고 물을 부어 콩을 삶았다. 아궁이에 지피는 땔감은 밭에서 콩을 털어낸 콩대와 콩깍지를 사용했다. 한몸이던 콩대와 콩깍지가 콩을 삶은 것이다.
자두연두기(煮豆燃豆萁)
두재부중읍(豆在釜中泣)
콩을 삶는데 콩깍지를 때니
콩은 솥 안에서 우는구나.
다 삶아진 콩을 절구에서 찧어낸 후 네모 반듯하게 만들면 메주가 되었다. 그 과정에 가마솥의 콩 위에 호박채와 쌀가루를 섞어 얹어 놓으면 콩이 삶아 지는 동안 익어 매주거리 간식이 되었다. 그걸 배불리 먹고 삶은 콩을 찧는 일을 해야했다. 그래서 어머니들은 메주 찧는 일을 '메주거리 값을 하는 일'이라고 했다.
왜 콩은 삶고 메주는 쑨다고 했을까? 삶는다는 것은 어떤 것을 물에 넣고 끓인다는 것이고, 쑨다는 것은 곡식의 알이나 가루를 물에 끓여 익혀서 죽이나 메주 따위를 만든다는 것이다. 둘다 물과 불이 만나야 이루어 질수 있는 일이다. 콩은 콩깍지와 콩대로 삶고 메주는 손으로 쑨다고 했다.

삶는 것은 물과 불이 하고 쑤는 것은 사람의 마음과 손이 한다고 했다. 그래서 삶는데는 물과 불이 뜨겁게 끓고 타올라야 하고, 쑤는 데는 느긋한 마음과 정성을 다한 손놀림이 들어가야 했다. 즉 쑤는 일은 손이 많이 가는 일이었다. 죽을 만들거나 메주를 만드는 일은 순전히 손을 많이 움직여야 하는 일이었다.
"할머니 올해는 메주 안 만드세요?"
"인자 그런 일은 우리덜 손이 마지막일거이그만. 노인네들 허리 잡아묵은 콩농사를 쫴깨라도 짓는 것은 자석덜한테 삼장 맹그러 줄라고 그렁것인디. 인자 모다 그렁것을 사묵고 사는 세상이 되얏뿡개로 노인덜이 인자 자식덜헌테 마음댈 끈이 없당개."
"할머니 삼장이 뭐예요?"
"아 뭣이냐, 저 장독대가먼 있잖아. 간장 된장 고추장 말이어"
"아~ 네에 그런데 왜 메주를 쑨다고 했을까요?"
"젊은 양반이 시시콜콜 별것을 다 물어쌌네. 고곳이 전부 손을 잡아 묵는 일이어. 콩이야 물붓고 불땐먼 삶아지는디. 그것을 찧고 네모지게 만드는 일은 전부 손으로 해야한당개. 일년농사 질때 하루에 손을 가장 많이 쓰는 일이 메주 맹기는 일인것이여. 콩 골라야제 물길어다 가매솥에 부어야제, 불때야제, 찧어야제, 네모지게 맹글어야제, 짚새끼로 매달아야제, 글고 나서 뒷정리 해야제, 손이 열개라도 모지랜 일이 메주 맹그는 일이랑개.
고곳처럼 손이 많이 가는 일은 정성을 쌓는 일인것이여. 긍개로 정성은 손에서 나온단 말이시. 메주는 손이 많이 간다 그래서 쑨다고 허는 것이랑개. 긍개로 요새처럼 기계로 헌것은 맹근 메주라고 허제, 쑨 메주라고 안허잖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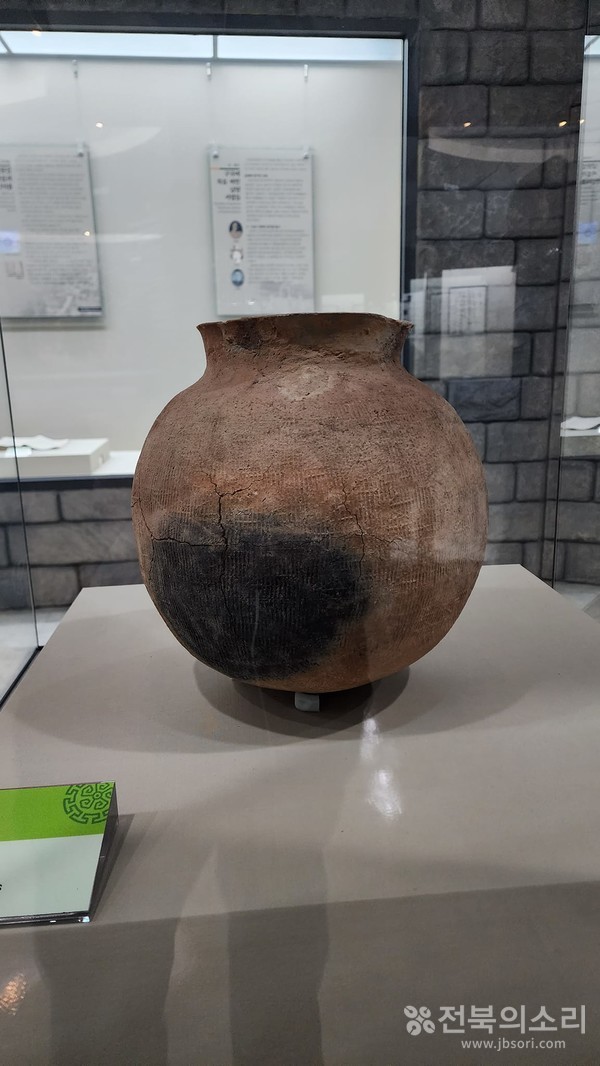
할머니 말씀에 '손 수'자와 '많을 다'자가 들어 있었다. 즉 메주를 쑤거나 죽을 쑤는 일은 정성을 쌓는 손이 많이 가는 일이라서 수다(手多)이고, 그것의 백성들 발음이 '쑤다'가 된 것이 아니었을까 싶다.
"할머니 저 마루에 내어놓은 박스는 뭐예요? 똑같은 것이 세 개나 있네요?"
"이 ~니얼 모레가 내 일흔일곱 생일인디, 객지 자석덜이 지 에미 생일 찾은다고 온디야. 근디 왔다 가뿔먼 내가 마음이 허전한개로, 뭐이라도 싸서 보낼라고 된장 한뭉테이썩 싸놨어."
" 아 ~ 네에 그런데 된장 박스 위에다 왜 빈 콩대를 올려놨어요?"
"우리 영감은 형제로 같은 동네에서 살다가 두 양반 모다 세상을 비랬는디, 우리 시아부지가 늘 그랬쌌대. 느그 형제는 콩대에 붙은 콩인개로 서로 우애있게 살아야 헌담서, 가실이 되먼 빈 콩대를 방안 시렁에 매달아 놓고 어릴때부터 그 말을 귀가 따갑게 들었대요. 그래서 평생동안 우애있게 살았담서나, 우리 자석덜한테도 된장 같은것 싸서 보낼때 빈 콩대를 함께 싸서 줌서, 그 이야기를 해야한다고 해서 내가 해마다 그렇고롬 헌디. 자석들은 도시로 갖고가먼 쓰레기만 된다고 알았다고 험서 안가져간디, 그래도 영감 말이었응개, 해마다 그렇게 허기는 해야제."

원님의 고을 통치는 백성들의 마음을 낱알 콩을 모아 메주 덩어리처럼 공동체를 만들어 내는 일이고, 관솔들의 업무는 백성들 마음 하나하나가 낱알콩처럼 충실하게 고을에 들어 차게 하는 일이다. 고을은 역사와 문화와 관광과 농산업이 함께 부모의 같은 배에서 나온 5란성 쌍둥이고, 고을 공동체는 그것들의 합이기 때문이다.
원님이 만능 재주꾼이어야 한다는 말은 통찰력을 가진 사람들을 잘 활용하여 그것들을 결합해 내는 것을 두고 한 말이었으니, 그 말은 유물이 아니라 지금도 용량과 속도가 넉넉한 '신 버전'이다.
/글·사진: 김용근(지리산문화자원연구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