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의 지명 이야기(전북대 지리교육학과 교수)
지명은 생성 원인에 따라
자연 환경에 기원을 둔 경우,
인문 환경에 기원을 둔 경우
그리고 인위적인 명명 등 3가지로 분류

우리나라 지명이 가장 큰 변화를 겪은 것은 통일신라시대인 756년 경덕왕 때에 있었던 지명의 한자화와, 일제 강점기 때인 1914년의 행정구역 개편이다. 이 시기에 지명 변화 과정을 겪으면서 원래 의미를 잘 살린 경우도 있지만, 원래 의미와는 전혀 다른 의미로 변용된 사례도 많다.
지명은 처음 탄생할 때 그 지역의 자연환경이나 인문환경을 반영하여 지어졌으나, 이 후 변화과정을 통하여 완전히 다른 의미로 변한 경우가 상당수 있다. 하나의 사례로 1957년에 전북 완주군 조촌면에서 전주시로 편입된 송천동(松川洞)의 경우 현재의 한자를 풀어보면 ‘전주천변에 소나무가 많았던 지역’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원래는 전주시에 편입하면서 이 지역이 오송리(五松里)와 시천리(詩川里) 지역이었기 때문에 가운데 글자를 한자씩 취합해서 송천동(松川洞)으로 명명한 것이다.
당시 오송리에는 사근리, 오송리, 신기리, 신풍리, 용소리, 덕중리 등의 마을이 있었고(현재 송천동의 남부 지역), 시천리에는 신동리, 시천리, 발단리, 와룡리, 용흥리, 용소리, 월평리 등의 마을이 있었다(현재 송천동의 북부 지역). 이 후 한글화하여 ‘솔내’로 부르기도 하지만, 한글 이름은 지명의 역사가 그리 길지 않다. 즉, 송천동(松川洞)이 먼저 탄생하고, 의미를 한글화한 ‘솔내’가 나중에 등장했다.
지명에 깃든 갖가지 사연들...자연 환경, 인문 환경, 인위적 원인
지명은 생성 원인에 따라 자연 환경에 기원을 둔 경우, 인문 환경에 기원을 둔 경우 그리고 인위적인 명명 등 3가지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먼저 지명중에는 지형, 기후, 위치 등의 자연환경에서 유래한 지명이 있다. 예를 들면, 전북 익산시 여산면 누항리의 ‘샐목’ 마을의 경우, 이 마을은 지하에 천호동굴과 연결되는 석회암 지형에 위치하기 때문에 비가 오면 물이 땅속의 석회동굴로 스며들어, 빗물이 땅속으로 새는 목 지역이라 해서 ‘샐목’이라고 하였다. 원래 주민들이 부르던 지명이었던 ‘샐목’을 한자로 바꾸는 과정에서 샐 ‘누(漏)’, 목 ‘항(項)’으로 한자화해서 ‘누항(漏項)’이라는 지명이 만들어진 것이다.
특히 누항마을은 산줄기와 분수계(740번 지방도의 천호터널)로 봐서는 행정구역이 완주군 화산면 운산리에 속해야 하지만, 산줄기를 넘어서 익산시 여산면 태성리에 속해 있다. 즉, 누항마을에 내린 빗물은 동쪽(화산면 운산리)의 고산천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천호산과 태백이산을 연결하는 고개(누항재) 밑의 땅 속에 형성된 천호동굴을 통해 서쪽의 익산시 여산면 호산리 방향으로 흘러 강경천으로 흐르게 된다. 즉, 누항마을의 빗물은 만경강의 지류인 고산천이 아니라, 금강의 지류인 강경천으로 흐르게 되는 것이다. 누항마을과 여산면 호산리 사이의 누항재 지하에는 천호동굴(천연기념물 177호)이 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는 충북 단양군 가곡면 여천리에 있는 ‘지전(池田)’ 마을이 있다. 단양군 역시 석회암 지형으로 비가 내리면 빗물이 하천을 형성하지 못하고 군데군데 형성된 돌리네(doline, 땅이 움푹 파인 지형)에 물이 모이고 지하에 형성된 싱크홀(sinkhole)로 빠져 지하 동굴로 흘러간다. 이 곳 돌리네는 움푹 파여 물이 고이기 쉬운 지형 조건이면서도 이 싱크홀을 통해서 물이 잘 빠지기 때문에 밭으로 많이 이용되는데, 주민들은 이곳에 조성된 밭을 연못에 있는 밭이라는 의미로 ‘못밭’이라고 불렀다. 이 후 한자화 과정에서 연못을 의미하는 못 ‘지(池)’, 밭 ‘전(田)’자로 변화해서 ‘지전리(池田里)’가 되었다.
화전(花田), 오리정(五里亭)...지명만으로도 지형 조건 알 수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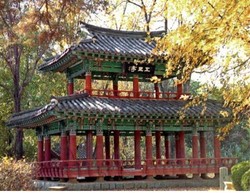
이외에도 지명만으로도 지역의 지형 조건을 알 수 있는 경우로는, 전주시 덕진구 화전동의 ‘화전(花田)’ 마을이 있다. 화전 마을의 원래 이름은 ‘곶밭’이었다. 즉, ‘곶밭’ 마을은 만경강변의 남쪽에 위치하는데, 만경강 쪽으로 삐죽 나온 ‘곶(串)’ 지역에 있는 밭이라는 의미였다(반대는 쑥 들어간 곳은 ‘만’). 그런데 사람들이 부르는 과정에서 ‘곶밭’을 ‘꽃밭’으로 부르게 되었고, 이것을 한자화하는 과정에서 꽃 ‘화(花)’, 밭 ‘전(田)’이 되어, 현재는 ‘화전(花田)’이 된 것이다. 원래는 ‘꽃밭’이 아니고 ‘곶’ 지역에 위치하는 밭이라는 의미인데, 완전히 다른 의미로 변한 사례이다.
두 번째는 생산물, 풍수지리, 인물, 교통 등의 인문환경을 반영해서 만들어진 지명이 있다. 남원(사매면)의 ‘오리정(五里亭)’은 동물인 오리와는 관계없이 오리(五里)마다 쉬는 지점에 세워진 정자를 의미한다. 즉, 전주에서 남원으로 가는 길에 있었던 휴게소였던 것이다. 또한 전주에서 남원으로 가는 길에는 사람들이 물을 먹었던 ‘주천리(酒泉里, 임실군 오수면)’, ‘대정리(大井里, 오수면)’ 등 나그네들이 물을 먹었던 샘물이 있었던 마을들이 있다.
이런 마을의 이름을 통해서 이곳에는 샘물이 있었고, 전주-남원 간의 도로가 통과했던 마을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전주에서 삼례로 가는 길에도 주막이 있었던 ‘구주리(舊酒里, 팔복동)’, ‘주업정(酒業亭, 고랑동)’, 달콤한 물맛이 나는 식수가 있었던 ‘감수리(甘水里, 팔복동)’ 등의 지명이 존재한다. 이러한 지명을 통해서 지금과는 다른 당시 사람들이 이용했던 도로를 알 수 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새로운 도시, 새로운 벌판을 의미하는 ‘철원(鐵原)’의 경우도 있다. 본래 철원은 후고구려(901-918)를 건국한 궁예(?-918)가 새로 도읍을 정한 곳으로 새로운 도읍지, 즉 새로운 벌판이라는 의미로 ‘새벌’이라고 했는데, ‘새벌’이 사투리로 ‘쇠벌’이 되었고, 쇠 ‘철(鐵)’, 벌판 ‘원(原)’으로 한자화 되어 ‘철원(鐵原)’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
상치등면과 하치등면 통합, 쌍치면(雙置面)
백암면과 백파면 통합, 이백면(二百面)

세 번째는 행정구역 변화나 언어의 변화, 지명의 조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위적인 지명이 있다. 특히 1914년 면명의 통합과정에서 지명의 조합에 의한 행정지명이 많이 탄생했는데, 대표적인 것이 전북 순창군의 쌍치면이다. 쌍치면 지역은 원래 ‘상치등면’과 ‘하치등면’ 지역인데 하나의 면으로 통합하면서 ‘치’가 둘이라는 의미로 쌍치면(雙置面)이 된 것이다.
그러나 남원시 이백면의 경우에는 ‘백암면’과 ‘백파면’을 통합하면서, ‘백’자가 두 개 겹친다고 해서 ‘이백면(二百面)’이라고 면명을 정한 경우도 있다. 또한 완주군 봉동읍의 경우는 ‘봉상면’과 ‘우동면’을 통합하면서 한자씩을 취하여 ‘봉동(鳳東)’이 되었는데, 봉황이 동쪽에서 나타났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와 같이 1914년 행정구역 개편 과정에서 조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행정구역명이 많기 때문에 현재의 면명으로 지명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는 오류가 따를 수 있다.
또한 행정구역의 변화로 역사적인 사건의 위치를 현재는 잘 알 수 없는 곳도 있다. 1894년 일어난 동학농민운동 또는 고부농민운동은 당시 전라도 ‘고부군(古阜郡)’에서 발생했지만, 지금은 고부가 정읍시의 1개면으로 변해서 위치를 찾기가 어렵게 되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의해서 고부군, 태인현, 정읍현이 통합되어 현재의 ‘정읍시’가 되었다. 1914년 이전에는 이 중 고부군이 가장 큰 행정단위였으나, 1914년 호남선의 개통으로 정읍역이 만들어지고, 통합된 3개 군현 중 가장 작았던 정읍현이 이 지역의 중심지가 된 것이다.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던 1894년에는 행정구역으로 이 지역의 중심지는 ‘고부’였고(지금의 고부면), 농민들은 관아가 있었던 고부관아를 공격한 것이다.
또 하나의 사례로는 천주교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건으로 다루어지는 ‘진산(珍山) 사건’ 역시, 현재의 위치를 아는 경우가 많지 않다. 1791년(정조 15년)에 일어난 최초의 천주교 박해사건인 진산 사건은 전라도 진산에서 윤지충이 그의 어머니상(喪)을 천주교 방식으로 행한 것이 발단이 되어, 천주교를 사학(邪學)으로 단정하여 천주교 서적의 수입을 엄금하고, 교도인 윤지충, 권상연 등을 사형에 처했던 사건이다(신해박해, 1791). 진산은 현재 충청남도 금산군 진산면 지역이다.
당시에는 행정구역으로 전라도 진산현이었지만,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의해서 금산현과 진산현(현재의 진산면, 복수면, 추부면 지역)을 통합하여 금산군이 되고 금산읍이 군의 중심지가 되면서, 진산현은 진산면으로 행정구역의 위상이 바뀌었다. 그리고 전라도 진산이라고 한 것은 지금은 이곳이 충남 금산군이지만 과거 금산군은 전라도에 소속되었으나, 1963년 행정구역 개편에 의해서 전라북도에서 충청남도로 행정구역이 변했기 때문이다. 1791년 당시의 행정구역을 이해해야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이다.
탄현, 황산벌, 주류성 등 백제 유명 지명들
지금도 정확히 알 수 없고 추정만 가능할 뿐
이외에도 1900년대 초반 1:50,000 지도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지도상 표기의 편의를 위해서 어려운 한자를 쉬운 한자로 바꾸면서 지명의 변화가 발생한 경우도 상당수 있다. 예를 들면, 진안군에 있는 ‘주줄산(珠崒山)’은 표기하기 쉬운 한자인 ‘운장산(雲長山, 1,126m)’으로 바뀌었다. 또한 완주군 구이면의 원래 지명은 ‘구암(龜岩, 거북바위, 구이면 덕천리 구암마을)’에서 유래해서 ‘구이면(龜耳面)’이라고 하였으나, 1914년 어려운 한자인 거북 ‘구(龜)’자를 음은 같지만 간단한 한자인 아홉 구(九)자로 바꿔 ‘구이면(九耳面)’이 되었다. 전주시의 경우에도 칼바위가 있어서 붙여진 ‘검암리(劍岩)’가 ‘금암리(金岩)’로 바뀐 경우도 같은 사례이다.
또한 과거의 지명이 현재 어디인가를 모르는 경우도 상당히 있다. 지명의 위치를 명확하게 알게 된 것은 지도에 지명을 표시하면서 부터인데, 1481년 동국여지승람에서 처음으로 지도에 지명을 표시했다. 따라서 그 이전에는 문서에는 등장하나 현재 위치를 알 수 없는 지명이 상당수 존재한다. 삼국사기(1145년)에는 지명이 기록에는 남아 있으나 현재의 위치를 알 수 없는 지명들을 부록으로 분류해 놓았다.
예를 들면 백제가 멸망하던 때인 660년 당시 신라군이 백제의 수도였던 사비(부여)를 향해 진격하는 데에 주요 전략적 지점이었던 ‘탄현(숯고개, 완주군 운주면 추정)’, 신라의 김유신 장군과 백제의 계백 장군이 전투를 벌였던 ‘황산벌(논산시 양촌면 추정)’, 당나라의 소정방군이 상륙했던 ‘기벌포(군산시 추정)’, 그리고 백제 부흥운동이 있었던 ‘주류성(부안군 상서면 우금산성 추정)’ 등은 아직도 위치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추정만 하고 있는 사례들이다.
이와 같이 지명은 땅의 이름이고, 그 이름을 통해서 위치를 알 수 있고, 땅이름을 통해서 그 지역의 자연환경과 인문환경 그리고 지역의 변화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지표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인위적인 조합에 의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특히 읍과 면의 행정구역명은 의미 해석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사람과 언론> 제3호(2018 겨울).
/조성욱(전북대 지리교육과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