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전북의 지명에 얽힌 사연과 통합론

'호남인구 충청권에 추월당했다' <전북일보> - 2013.6.13.
'만년 낙후 호남, 인구마저 충청에 밀리다니' <광주일보> - 2013.6.12.
광주·전남과 전북을 포함한 호남권 인구가 90여년 만에 충청권에 역전됐다는 지역언론들의 보도가 나오기 시작한 7년 전, 당시 전북일보와 광주일보가 포문을 열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때만 해도 낯설었지만,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게 됐다.
충청권의 세종시 출범과 행정수도 이전 과정에서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돌아켜보면, 광주와 전남은 물론 전북지역 언론들은 당시 '1925년 근대적 개념의 인구조사를 실시한 이후 처음으로 충청권에 추월당했다'며 흥분들을 가라앉히지 못했다.
<전북일보>는 당시 "이농 현상으로 인해 농촌지역의 인구 이탈 현상은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지만 전북은 물론, 전남과 광주를 포함한 호남권역의 인구감소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수치"라고 기사에서 밝혔다.
<광주일보>는 '만년 낙후 호남, 인구마저 충청에 밀리다니'란 제목의 사설에서 분통을 터뜨렸다. 사설은 "광주와 전남·북 인구가 처음으로 충청권에 추월당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영남권은 그렇다 치더라도 충청권에도 밀리다니 충격이 아닐 수 없다"고 고 한숨지었다.
2013년 5월말 기준, 호남권(광주 147만 1,801명, 전남 190만 6,335명, 전북 187만 1,592명)의 인구는 524만 9,728명인데 반해 충청권(대전 152만 9085명, 충북 156만 7,548명, 충남 203만 6,661명, 세종시 11만 6,842명)은 525만 136명으로 조사됐다. 호남권보다 충청권 인구가 408명 많은 것으로 조사된 것. 그 후 그 격차는 갈수록 벌어졌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세종시 출범 직전인 2012년 6월 인구는 충청이 520만 4,186명, 호남은 525만 188명이었다. 하지만 2013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충청이 호남 인구를 추월한 이후 2019년 9월(전국 5,184만 9,253명) 기준 충청 인구는 553만 7,652명으로 늘었다. 반면 호남은 514만 8,430명으로 줄었다. 두 지역 간 격차는 38만 922명으로 커졌다.
충청권과는 달리 호남권의 인구유입 전망은 썩 밝지 못하다. 기업 유치도 지지부진한데다 농어촌은 고령화로 갈수록 인구가 줄고, 도시에서는 일자리가 없어 젊은이들이 외지로 떠나는 바람에 인구 유출현상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
최근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9년 전북의 이동률(인구 100명당 이동자 수)은 16.5%을 기록했다. 20년간 연평균 이동인구가 10만 1천 402명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전북지역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20∼30대 순유출이 전체 순유출 중에서 90%를 넘어섰다는 통계수치는 암울한 미래를 예고한다.
전주·완주 통합논의 불씨, 완전히 꺼졌나?

"이러한 심각한 상황은 무엇보다 역대 정권의 책임이 크다"고 지역언론들은 목소리를 높여왔다. 특히 영남권 산업화와 수도권 중심의 정책, 그리고 최근에는 충청권에 행정도시와 투자가 크게 늘면서 상대적으로 호남권은 더욱 피폐해지고 있다는 분석들을 자주 내놓는다.
이런 상황에서 전북은 인구유출이 날로 심화돼 180만선을 간신히 턱걸이하고 있다. 같은 호남권에서도 상대적 박탈감이 높다. 한 때 200만 명 이상의 인구를 유지했던 곳이었다. 그래서 대안으로 선거 때만 되면 단골로 등장하는 메뉴가 바로 전주시와 완주군의 통합문제였다.
완주·전주, 전주·완주 통합논의는 새만금 방조제와 간척사업 등 인근 개발사업과 함께 여야는 물론 지방선거, 총선, 대선을 막론하고 선거 때만 되면 정치권의 주요 민심자극제로 이용돼 왔었다.
2013년 충청권에 인구가 밀리면서 위기 의식이 작용할 무렵, 지방선거를 앞두고 통합논의는 매우 뜨거웠다. 인구 64만 8천명인 전주시와 8만 6천명인 완주군이 통합되면 시너지 효과를 만들 수 있다며 통합론에 먼저 불을 지피는 쪽은 역시 정치권이었다. 완주군보다 전주시가 더욱 적극적이었다. 당시 인구통계조사 발표 이후 더욱 힘을 받는 분위기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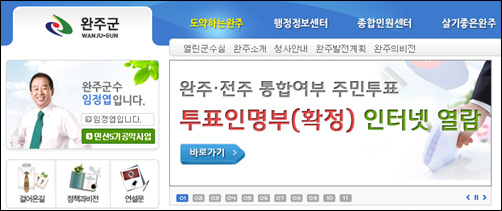
송하진 전주시장, "전주-완주 통합, 인구 100만명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하더니
2013년 1월. 당시 송하진 전주시장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전주시와 완주군이 통합, 인구 100만명 시대를 열겠다"면서 구체적 비전을 내놨다. 이른바 4대 발전거점과 2대 특화지역 조성이 그 뼈대였다.
그런 후 2013년 6월 18일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는 전주시가 제출한 '전주시·완주군의 행정구역 통합 제안' 건에 대해 찬반 표결 결과 '찬성 의견'을 채택할 정도로 활발했다. 전주시의회는 2013년 6월 21일 '전주시와 완주군의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전주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통합을 찬성하는 의견을 채택했었다.
시의회는 당시 참석의원 32명 가운데 28명이 통합에 찬성, 압도적인 표차로 통합을 찬성했다. 따라서 양 지역 통합은 남은 완주지역의 주민투표 결과에 이목이 쏠렸다.
그런데 양 지역 행정구역 통합은 1997년과 2009년에 이어 또 다시 무산되고 말았다. 완주군 주민투표 결과 유효 투표자의 50% 이상이 반대한 때문이다.
이처럼 1992년 9월 전주시의회 제88회 임시회에서 최초로 거론돼 온 전주시와 완주군 통합논의는 그동안 수차례 반복돼 왔으나 번번이 무산돼 왔다. 정치적 이해득실에 의해 선거 때만 되면 고질병처럼 등장했던 이슈가 결국 주민투표로까지 가게 됐지만 무산되고 말았다.
원래 하나의 뿌리였던 전주-완주는 일제강점기인 1935년 강제 분할됐다가 지난 20여년간 통합 논의가 진행됐으나 '흡수 통합'을 우려하는 완주군 측의 반대로 진전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전주(全州)의 옛 지명은 완산(完山)인데다 전주와 완주의 전(全)과 완(完)은 모두 '온전하다'란 뜻을 가진 지명이기 때문에 이미 통합은 기정사실"이라는 통합론자들의 주장은 쉬 사라지지 않고 있다.
더욱이 전북은 지명과 관련된 흥미로운 얘기들이 많은 곳이다. 그래서 전주-완주, 완주-전주 통합에 대한 미련이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용담댐'·'뜬봉샘' 등 전북의 지명에 얽힌 사연이 주는 힌트
먼 옛날 선조들이 지어놓은 땅 이름(지명)이 훗날 딱 들어맞는 것을 보면 신기할 정도다. 땅 이름이 현실과 같아지는 예언성 지명을 들여다보면 경탄할 정도다. 전북지역은 비록 산업화는 더디지만 산세·지세·수세가 뛰어나고 풍광이 좋아 가는 곳마다 지명에 얽힌 재미난 사연들이 많다. 선조들이 지은 지명에 얽힌 사연들로 전북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들여다보았다.
전북 진안군 용담면 월계리의 금강 상류에 있는 용담(龍潭)댐은 지명과 그대로 맞아떨어진 대표적인 곳이다. 용담(龍潭)은 '용 용(龍)'자에 '못' 또는 '깊을 담(潭)'자의 지명으로 '용이 자리를 틀고 있는 깊은 연못'이란 뜻을 지녔다.
용담댐이 생기기 전에는 용담면에 살고 있던 주민들은 왜 큰 물줄기가 없는 이곳의 지명에 '못 담'자가 들어가는 용담인지 의아해했다고 한다. 다만 주위의 안천과 주천과 정천이라는 '내 천(川)' 자가 들어가는 마을의 골짜기에서 물이 흘러나와 용담면에서 하나로 만나 작은 강을 이루어 금강 하류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봐 왔을 뿐이다. 이처럼 용담댐이 생기기 전에 용담면에는 작은 강이 흐를 뿐이었다.

그런데 이곳에서 1990년부터 댐이 건설되기 시작해 지금은 거대한 호수가 생겼다. 더구나 댐이 완성되고 물이 수몰지역에 차오르자 용담이라는 말 그대로 용(龍)의 형상이 나타났다. '용'자와 더불어 깊은 연못을 뜻하는 '담'자가 들어가도록 지었던 선인들의 선견지명이 서려 있는 대표적인 곳이다. 댐 완공 후 수몰선을 따라 물에 잠겨 호수의 형상이 용의 모양을 이루며 용담면이라는 이름과 실제 현실이 맞아떨어지게 되자 마을 사람들은 "용이 살 수 있는 땅이 됐다"고 이구동성으로 감탄해하고 있다.
진안 용담댐에서 차로 약 30분 거리를 달리다 보면 장수(長水)군이 나온다. 이곳은 진안군과 임실군, 남쪽은 남원시, 북쪽은 무주군과 접하고 있는데, 지명에 담긴 '긴 물'이란 뜻을 가진 곳이다. '천리 물길이 만들어낸 곳'이라고 장수군은 자랑한다. 물이 맑기로 유명한 '수분리'를 분수령으로 남으로는 섬진강, 북으로는 금강이 흐른다. 물의 뿌리가 되는 샘이 있는 고장엔 사연도 많다. 특히 '뜬봉샘'은 훗날 금강의 발원지가 됐다. 뜬봉샘 주변은 금강뿐만 아니라 섬진강의 분수령이 자리하고 있어 다양한 설화도 전해지고 있다.
그래서 장수군은 도로마다 지역 특성과 역사성, 마을이름 등이 반영된 새 도로명을 확정했다. 의암로, 용성로, 호비로 등 장수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적 명칭을 부여한 도로를 비롯해 개실길, 뜬봉샘길, 느랕길, 문성길 등 마을 옛 지명을 반영했다.
온천 나오는 '목욕리'· 개천에 물 '옥구'... 예언 적중
그런가 하면 개 한 마리가 지명을 바꾼 곳도 있다. 전북 임실군 오수면 오수리에 가면 의로운 개를 기린 의견비가 서 있다. 개 한 마리 때문에 '거령'이라는 지명이 개나무골을 뜻하는 '오수(獒樹)'로 바뀐 곳이다. 1,000년 전 거령현(지금의 임실군)에 사는 사람이 기르던 개가 불길에서 주인을 살리고 자신은 불에 타 죽었다 하여 그 땅을 오수라고 이름 지었다.
마을 이름과 훗날 변천과정이 똑같은 곳도 있다. 전북 정읍시 산외(山外)면 목욕(沐浴)리의 지명은 '머리를 감으며 몸을 씻는다'는 뜻의 '목욕'이란 뜻을 지닌 곳이다. 그런데 지명 그대로 이곳은 1999년 1일 채수량 3100t 규모의 거대 온천 수맥이 확인돼 온천하나 없던 인근 주민들을 활짝 웃게 만들었다.
전북도로부터 온천지구로 지정 고시된 이곳은 예로부터 선녀들이 내려와 목욕을 했다는 '선녀욕지'로 이곳 물을 먹고 목욕을 하면 병이 낫는다고 소문이나 나환자들의 은신처였던 골터가 실재했는가 하면 마을 가운데에는 한겨울에도 얼지 않는 우물이 솟아나는 등 물에 얽힌 사연이 끊이지 않았다. 이로 인해 온천 부존지가 아니냐는 추측이 무성했던 지역이다.

임실군 강진면 옥정리(玉井里)도 사연이 많은 곳이다. 이 마을은 '옥처럼 맑고 찬 샘'의 뜻을 지녔다. 조선 중기에 어느 스님이 이곳을 지나가다가 '멀지 않아 맑은 호수, 즉 옥정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적중한 곳이다. 1965년 이곳에 농업용수 공급과 전력생산을 위한 '섬진강 다목적댐'이 건설되면서 수위를 높였고 운암면의 가옥 300여 호와 경지면적 70%가 수몰돼 지금의 모습으로 자리 잡았다. 이곳이 바로 '옥정호'다.
여의도 면적의 140배 규모에 달하는, 세계에서 가장 긴 33.9km의 방조제를 쌓아 조성된 광활한 간척지 개발사업의 중심에 있는 군산시 옥구군(沃溝郡)의 지명 또한 현실과 잘 들어맞는다. 금강, 만경강, 동진강 하구를 둘러싼 갯벌의 중심에 있는 이곳은 새만금사업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지명을 풀이해 보면 '물댈 옥(沃)'자에 '개천 구(溝)'자를 합한 이 곳은 '개천에 물을 댄다'는 뜻을 갖고 있다. 새만금사업으로 개천에 물을 대는 것이 현실로 드러났으니 이 역시 지명이 들어 맞은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완주-전주, 전주-완주 통합논의 불씨는 완전히 꺼진 것일까? 아니면 언젠가 되살아나 온전하고 으뜸가는 지역으로 변모할까? 자못 궁금하고 기대되는 '불씨'임은 분명하다.
/박주현 대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