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언각비(20) -인내의 화신 매미

“굼벵이가 지붕에서 떨어지는 것은 매미가 될 셈이 있어서 떨어진다.”
우리 속담인데 무슨 뜻일까. 남이 보기에는 하찮고 미련한 행동일지라도 제 딴에는 요긴한 뜻이 있다는 말이다. 굼벵이가 떨어지면 사람들은 잘못해서 떨어졌으려니 하고 비웃을 것이다.
하지만 속단은 금물이다. 저 굼벵이, 제 딴에는 뜻이 깊다. 땅속으로 들어가 매미가 될 뚜렷한 목적이 있어서 떨어진 거다. 그래서다. 남 보기에는 못나고 어리석은 행동도 그렇게 하는 그 자신에게 있어서는 요긴한 뜻이 있다는 것을 유념할 일이다.
약간 결은 다르지만 비슷한 느낌을 주는 말도 있다.
“쇠똥구리는 스스로 쇠똥 굴리기를 즐겨하여 여룡(驪龍)의 여의주(如意珠)를 부러워하지 않는다. 따라서 여룡도 여의주를 가졌다는 것을 스스로 뽐내어 저 쇠똥구리가 쇠똥 굴리는 것을 비웃어서는 안 된다.”(이덕무, ‘선귤당농소’)
매미가 운다. 백로가 지났는데도 쓰르라미가 운다. 대부분 가을을 고대하는 인간들과는 달리 짝을 찾는 매미는 가는 계절이 아쉬워 애타게 울고 있다. 마치 얼마 남지 않은 자신의 운명을 알고 있다는 듯이 말이다. 백로를 예기 월령(禮記 月令)에서는 “초가을이니 흰 이슬 내리고 쓰르라미가 운다.(孟秋之月, 白露降, 寒蟬鳴)”라고 적고 있다.
매미들은 보통 여름철 한 철을 한껏 울어 댄다. 그러나 올해는 긴 장마 때문이었는지 아직껏 울기를 그치지 않는다. 입추가 지나면 매미는 더 정열적으로 울어댄다. 빨리 짝을 만나 이승에서의 사랑을 나누고 떠나야하기 때문이다.
매미는 수컷만 독특한 발음 기관을 가지고 있어 소리를 낼 수 있기에 들리는 모든 매미 소리는 수컷의 울부짖음이다. 암컷은 아무런 소리를 내지 못한다.
매미는 덧없는 목숨의 상징이 될 만큼 수명이 짧다. 알려진 바대로 짧게는 3년, 길게는 17년을 애벌레로 땅속에서 견딘다. 그러다가 허물을 벗고 세상에 나와 보름에서 한 달가량 울며 짝을 찾아, 수컷은 짝짓기를 하고 암컷은 애벌레를 낳은 뒤 죽는다.
매미는 기나긴 시간을 애벌레로 땅속에 있다가 세상 밖에서 보내는 시간은 고작 일주일, 길어야 한 달 안팎에 지나지 않는다. 매미 울음소리는 짧은 이생에서 암컷을 향한 수컷의 절박한 구애다. 소리가 클수록 짝짓기 성공률이 높다고 하니 목숨을 건 절규나 다름없다.
이런 매미들에게 옛 선비들은 5덕 곤충(蟬五德)이란 근사한 별명을 붙였다. 매미는 일찍이 덕(德)을 갖춘 벌레라고 생각됐다. 중국 진나라 육운(陸雲)은 한선부(寒蟬賦)에서 특별히 매미의 다섯 가지 덕목을 찬양했고, 송나라 때 구양수를 비롯한 많은 문인들도 매미를 노래했다. 문인뿐만 아니라 화가들까지 다퉈 매미를 그렸다.
육운은 한선부 서문에서 “공기를 마시고 이슬을 머금어 그 덕이 청결하다”고 매미를 칭송했다.
조선 중기 문신 허목의 시에도 이와 비슷한 표현이 나온다.
“바람을 마시고 사니 마음은 진정 비었겠네/ 이슬만 머금는다니 몸 또한 조촐하구나/무슨 일로 가을날 새벽부터 저리 슬피 우는가”
조선 시대 임금님 머리엔 매미가 앉아 있었다. 매미 날개 모양의 익선관(翼蟬冠)을 썼기 때문이다. 매미는 청백리의 표상인 오덕(五德:文·淸·廉·儉·信)을 상징한다. 조선 임금이 정사를 볼 때 머리에 쓰던 익선관은 매미의 날개를 본 뜬 것이다. 매미의 오덕(五德)을 생각하며 백성을 다스리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있다. 임금은 익선관을 썼고 신하들도 펼친 매미 날개 모양인 오사모(烏紗帽)를 썼다. 이는 매미의 오덕을 결코 잊지 말자는 의미다.
문·청·염·검·신(文·淸·廉·儉·信) 5덕 가진 매미

육운의 ‘매미 5덕’은 문·청·염·검·신(文·淸·廉·儉·信)이다.
요약하자면 매미의 머리가 관(冠)의 끈이 늘어진 형상이니 문인의 기상을, 이슬을 마시니 청정함을, 곡식을 먹지 않으니 청렴함을, 거처를 만들지 않으니 검소함을 갖춘 것이며, 때에 맞춰 허물을 벗고 나와 자신의 도리를 다하며 울어대니 신의를 지킨 것이라 했다.
익선관에는 매미의 이같은 덕목을 왕이 갖춰 선정을 베풀어야 한다는 깊은 뜻이 있다. 백성을 섬겨야하는 왕으로부터 관리들에 이르기까지 유념해야 할 대목들임에 틀림이 없다.
과연 한낱 곤충에 불과한 매미가 육운이 시에서 말한 것처럼 덕을 갖추었을까? 육운이 후세에 교훈을 주고자 본인의 평소 생각을 매미에 빌어 표현한 것일 뿐이다. 하지만 곤충학적으로 입증된 것은 매미가 보통 3년부터 17년간 땅속에서 애벌레로 지내며 나무뿌리의 진을 빨아먹고 자란다는 것과 성충이 된 후 지상에서 1~3주밖에 못살고 생을 마친다는 점이다. 그만큼 인고의 기간에 비해 짧은 생을 살지만 남에게 해는 끼치지 않는 곤충임은 확실하다. 이점에서 매미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크다.
그러고 보면 《가곡원류》에 실려 전하는 이들의 소리를 의탁한 시조 한 수가 생각난다.
“매암이 맵다 울고, 쓰르라미 쓰다 우니 / 산채(山菜)를 맵다는가, 박주(薄酒)를 쓰다는가 / 우리는 초야(草野)에 묻혔으니 맵고 쓴 줄 몰라라.”
매미와 쓰르라미가 내는 소리의 유사성에 근거해 새로운 의미를 뽑아내면서, 안분지족(安分知足)하는 삶의 가치를 드러냄이 퍽이나 이채롭다.
예로부터 우리네 선조들은 공직자들이 지켜야 할 오덕을 갖춘 매미를 본받고자 했다.
그래서 왕과 관료들이 쓰던 모자의 뒤에 한 쌍의 매미 날개를 달았다. 옛날 임금들은 매미 날개를 형상화한 익선관을 쓰고 국정을 돌봤다. 익선관과 오사모를 쓰고 서로 마주 볼 때 마다 매미처럼 청렴하고 검소하게 생활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뜻이겠다.
그런데 이에 대한 옛사람들의 의미부여는 각별했다.
중국 북송 때의 학자 구양수(歐陽脩)는 ‘명선부(鳴蟬賦)’란 글을 지어 심원한 예술론으로 발전시켰다.
“여기에 한 물건이 있어 나무 끝에서 우는데 / 맑은 바람 끌어들여 긴 휘파람 불기도 하고 /가는 가지 끌어안고 긴 한숨을 짓기도 하네/ 맴맴 우는 소리 피리 소리와는 다르고 /살살 맑은 소리 가야금 소리와 같네….”
매미의 오덕 중 이슬을 먹고 산다는 부분은 오해의 산물이다. 매미의 먹이는 나무 진액이다. 그렇긴 한데, 일단 멋도 있고 하니 이슬이라고 해 두자.
여름이 저물어갈 무렵, 여치가 아름다운 노래를 불렀다. 나귀가 그 목소리에 취해 물었다. 무얼 먹으면 노래를 잘할 수 있느냐고. 여치는 이슬이라고 했다. 나귀는 이슬이 내리기를 기다리다 굶어 죽고 말았다. 이솝우화의 한 토막이다.
그러나 이제는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 밤도 낮처럼 밝아졌고 열대야까지 자주 생기니 밤낮의 구분이 모호해졌다. 사익과 공익, 정의와 불의의 구분도 애매해졌다. 매미는 밤에도 울 수밖에 없고 선비는 불의에 눈감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세상인심은 변했다. 그렇다고 선비가 불의에 입 막고 눈 감아야 하는가. 그러고도 선비라 할 수 있는가.
세상 이곳저곳에서 떳떳치 못한 이런저런 욕심을 놓고 끊임없이 뒷거래와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본다. 특히 업계와 공직사회에서의 추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래서인가. 머리에 이고서 까지 매미의 ‘5덕’을 기리려 했던 조상들을 생각하게 된다. 근래 들어 과다한 농약 사용,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이 빚은 자연파괴와 온난화로 인한 장기간의 장마, 폭우, 강력한 태풍 등까지 그 매미의 울음소리를 더욱 잦아들게 하는 것 같다. 매미의 울음소리를 그리워할 때가 가까워지는 듯해서 조바심 난다.
그래도 누군가는 깨어있어야 한다. 익선관을 쓰고 오덕의 깃대를 들어야 한다. 세상이 아무리 혼탁하고 추악해져도 어찌 맑은 것과 흐린 것을 구분하지 못하겠는가? 염치를 아는 선비가 어찌 파렴치한 짓을 할 수가 있겠는가? 힘들어도 신의를 지킬 때 향기가 난다는 것을 어찌 모를 수가 있겠는가? 예나 지금이나 선비는 존재한다. 또 그 역할을 기꺼이 맡는다. 그러므로 맑고 곧은 매미의 오덕이 그 울음소리보다 크게 세상에 가득 울려 퍼지기를 소망한다.
오늘날은 국민을 위해 간(諫)해야
“입추 날이 되면 한선(寒蟬)이 울기 시작한다. 그때 매미가 울지 않으면 신하들이 힘껏 간(諫)하지를 않는다.(立秋之日 寒蟬鳴 不鳴 人臣不力爭)”
주서(周書)에 씌어 있는 말이다. 그렇다면 매미의 울음은 누군가를 간(諫)하는 역할을 한다는 뜻이다. 요새는 백성(국민)이 임금이다. 무엇을 간할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누구에게 간할 것인가는 정해져 있다. 바로 백성(국민)에게 간하는 것이다. 더구나 SNS 등의 발달로 세상의 갖가지 정보들이 매우 신속하고 자유롭게 유통되고 있는 현실이다. 때문에 국민들의 판단과 현실인식 수준이 대단히 높고도 현명하다.
그러므로 신하(공직자)들의 간언이 과거 어느 때보다 정직하고 준엄해야 한다. 주서에 나온 역쟁(力爭)이란 바로 역간(力諫)이다. 한편으론 힘껏 다룬다는 뜻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해 놓고 보니 이 문민(文民)세상에서 매미의 역할이나 간관(諫官)의 역할을 맡아서 해야 할 것은 언론이라고 귀결된다.
공자도 비슷한 말을 했다. “저자에 매미소리가 있으면 조정(朝廷)에는 쓰르라미 소리가 요란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정치는 온통 떠들썩해진다.(市有蟪蛄之聲則朝有蜩螗之沸 政之譁也甚矣)”
전북언론 맹성과 통렬한 뉘우침 요구돼
언론은 간관이 되기에 앞서 저자의 매미소리가 먼저 되어야만 된다. 저자 즉 시중에 떠도는 여론이 곧 역간(力諫)의 바탕이 돼야 한다. 그 기본이 여론조사나 설문조사 등으로 뒷받침해줘야 하는 것은 합리적인 절차이자 방법론이다.
그러나 전라북도의 현실은 여론의 왜곡 또는 편향이 심히 우려되는 실정이다. 최근 『전북의 소리』 보도가 지적했듯이 대부분 전북지역 일간지들의 경우 요즘 들어 ‘송하진 신문’ 또는 ‘전북도정 신문’이란 소릴 들을 만큼 의제선정이나 이슈메이킹, 가치평가에서 무비판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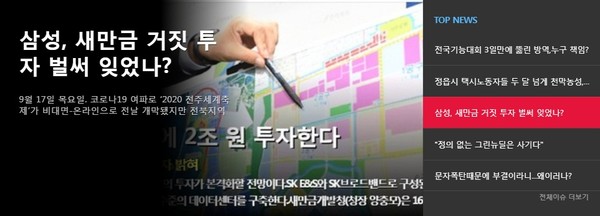
더구나 수많은 도내 일간지들이 보도·논평·주장·지면구성 등에서 차별화를 보이지 못하고 대동소이 내지는 스테레오타이프화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자사 이기주의까지 가세해 진정한 비판과 감시, 여론 선도 및 비전 제시 등의 순기능을 과연 얼마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극히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판단에 이를 수밖에 없다.
옛날 희랍 사람들은 매미를 중요한 요리 재료로 사용했다고 전해온다. 금방 태어난 성충을 특히 좋아했다고 한다. 지난날 전북의 언론은 정치세력이 탐식하는 중요한 요리재료의 하나였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그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 이 점에서 전북의 언론은 고대 희랍의 매미와 비슷하다. 전북 언론 당사자들과 경영진의 맹성과 통렬한 뉘우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더 이상 추락해서는 안 된다.
장자(莊子)는 여러 가지 신비하고 유장(悠長)한 사건을 엄청 많이 알고 있었던 사람이다. 그런데 매미에 관해서는 너무 빡빡하고 단편적인 편견을 갖고 있었던 모양이다. 그는 말했다.
“하루살이 버섯이 초하루와 그믐을 알 턱이 없다. 매미란 놈이 봄과 가을을 알 턱이 없다.”(朝菌不知晦朔 蟪不知春秋)
‘고선지부지설(苦蟬之不知雪)’이라는 말이 있다. 매미는 겨울에 내리는 눈을 알 수 없다는 얘기다. 그도 그럴 것이 성충으로 겨울을 살지 못하는 매미가 어찌 겨울을 알겠는가. 어리석거나 어설픈 사람을 얕잡아 비웃을 때 동원되는 표현이다. 하지만 이거야말로 턱없는 오해다.
매미는 애벌레 형태로 5년을 지낸다. 어떤 종류는 17년이나 지내는 것도 있다. 그러니 봄과 가을의 바뀜을 어찌 모르랴. ‘보지 못했다고 해서 믿지 않는 것은 매미가 눈을 모르는 것과 같다.’(不覩而不信 苦蟬之不知雪)라고 한 말도 매미의 애벌레로서의 삶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매미는 노래하는 동물이다. 매미 가운데 노래하는 쪽은 수컷만이다. 한국의 언론은 문민시대가 되면서 새로 태어난 매미와 같다.
수매미는 세 가지의 확실하게 구별되는 소리를 낸다고 한다.
첫 번째는 민중의 노래다. 이것은 다른 수컷들과 함께 부르는 노래로서 날씨조건에 따라 목소리가 달라진다. 날씨가 침울하면(비가 오면) 아예 노래를 거부해버리기도 한다. 둘째는 구애의 노래다. 이것은 대체로 짝짓기에 앞서 암컷에게 보내는 노래다. 셋째는 분노의 고함이다. 성가심을 당해 도망쳐 날아갈 때나 잡혀갈 때 부르는 노래다.
매미의 이러한 정서와 분별력이 언론에도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친화력도 있고 정서도 있고 분노도 있어야 언론다운 언론일 테니까 말이다.
예로부터 매미(蟬)는 신선(仙)과 음이 같고, 또 이슬을 먹고 산다 하여 신선의 상징이었다. 매미는 전형적인 변태과정을 거치면서 일생을 보낸다. ‘매미 허물 벗는다’는 말 그대로다. 변화가 필요할 때는 지극한 변화를 서슴지 않는다. 마지막 성충이 되는 단계는 신선이 되는 단계처럼 미화돼 우화(羽化)라고 불린다. 우화등선(羽化登仙)이 그것 아니겠는가. 우화한 뒤에는 겨우 한 달 정도를 살고 말지만 이 한 달을 수놈은 노래하고 암놈은 알을 낳기 위해 기나긴 세월을 유충의 흉측한 몰골을 하고 지내는 것 아닌가. 그래서 매미는 유난히 많은 시인들의 주제가 됐다.
곤충들은 대부분 밤에만 노래한다. 그래서 세레나데 합창단이다. 그러나 매미는 낮에 노래하는 특별한 곤충이다. 신문이 밤의 대통령 칭호를 들어서는 안 된다. 낮에 백성을 간(諫)하고 있어야 한다.
바른, 참된, 밝은 소리 들려주는 게 매미의 할 일
폭염과 장마, 그리고 태풍으로 맹렬했던 여름은 처서를 지나 백로에 이르면 그 위력을 잃는다. 하늘이 높고 대기는 청량하니 달빛과 별빛이 맑고 곱다. 흰 이슬은 들판의 풀과 꽃들을 적시고 세월은 속절없이 흘러간다. 매미 소리 잦아들고 서늘한 기운이 옷깃을 파고든다.
긴 장마와 몇 개의 태풍을 견딘 숲은 드문드문 단풍이 들기 시작하고 하루가 다르게 추색(秋色)이 물들어 갈 것이다. 먼 산에 비를 예고하는 바람꽃이 자주 피고 비에 젖은 낙엽위로 스산한 바람이 스친다. 흰 이슬에 ‘한 해의 저녁’, 가을이 젖는다.
냉정과 열정사이, 작금의 우리 상황에 대한 개인적 소회다. 코로나 전염병 공포에 얼어버린 세상인심과 경제, 이런 때는 위안을 받자. 누구에게 받아야 하는가. 답은 나와 있다. 종족을 보존해야 하는 뜨거운 열정이 있다. 이제 드디어 거기에서 운다. 그 남자(단순히 수컷), 매미가. (매미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바른 소리, 참된 소리, 밝은 소리를 들려주는 일이다.)
예부터 우리들은 매미의 다섯가지 덕목을 배우고자 했으면서도 우리 사회 안에는 여전히 부조리가 존재하고 있다. 한여름 무더위에서도 우리들을 일깨우기 위해 목이 쉬도록 울어대는 매미의 가르침을 되새겨야 한다.
조선 중기 성리학자인 이행(李荇)도 ‘매미’라는 시에서 ‘너의 천성이 자못 높고 깨끗하니, 누가 감히 하찮은 벌레라 하겠는가?(爾性頗高潔 誰言蟲類微)’라며 매미의 덕을 노래했다.
7일 살려고 7년 견디는 인내 배워야
매미는 인내의 화신이다. 매미의 인내심도 배워야 한다. 매미는 1주의 기쁨, 1주의 밝은 삶을 위해 7년 동안이나 땅속에서 어둠의 아픔을 감내한다. 수년 동안 땅속에서 유충으로 살다가, 단 한 달여 만을 매미로 살 뿐이다. 매미는 성충으로 살아 있는 기간이 일주일 또는 길어야 한 달이다. 그런데 매미가 되려면 적어도 6년에서 17년이라는 기간을 애벌레로 지낸다.
한 달을 지상에서 보내기 위해 애벌레로 몇 년이고 참고 기다릴 줄 아는 매미, 인내하고 기다린 자의 화려한 변신. 매미는 땅속에서 굼벵이로 7년을 살다가 세상에 나와 7일을 살다 죽는다. 일생의 거의 전부를 땅속에서 살다가 가지만 선조들은 매미에게서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했다.
보이는 것에 욕심내지 않고 깨끗하고 청빈하게 살다가 때가 되면 매미처럼 조용히 떠날 줄 아는 인생도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하나이지 않을까 한다.
입을 꾹 다물고 곧은 말을 기피해서는 안 된다. 시키는 대로 맴맴 읊어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그러나 사람들 중에는 겨울매미가 있을지 몰라도 매미들 중에는 겨울매미가 없다. 매미는 비겁한 겨울을 살기보다 당당한 죽음을 택한다. 매미는 죽어서 개미의 밥이 된다. 죽어서도 자신의 모든 것을 남에게 내어 준다. 그러니 어찌 선비의 표상이 되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어찌 보면 우리 인간의 삶도 매미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을지도 모른다.
매미가 우화(羽化)로 땅속의 인고의 세월을 보상받듯 사람도 지금은 삶의 무게로 힘들고 괴로워도 참고 견디면 언젠가 날개가 돋아나 세상을 휠휠 날아다니게 될지 아는가. 어쩌면 우리는 이미 날개를 달고 있는지도 모른다. 단지 나는 기술을 터득하지 못했을 따름일 뿐.
가끔 자신의 삶을 자책하며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마주친다. 영국 시인 윌리엄 워즈워스는 “나쁜 날씨는 없다. 다만 옷을 잘못 입었을 뿐이다” 고 말했다. 워즈워스 말처럼 나쁜 날씨가 없듯이 나쁜 삶도 없다. 그저 각자 입은 옷이 다를 뿐이다.
그러니 자신의 존재 그 자체로 이미 빛나는 생(生)임을 모두 깨달았으면 좋겠다. 우화등선(羽化登仙)이 별건가. 사람이 어떻게 날개가 돋겠는가. 마음속에 날개를 달고 하늘로 올라가 신선이 되면 되는 것 아닌가. 나는 기술은 오로지 자신이 터득해야 한다.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으므로.
/이강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