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성의 '이슈 체크'
사마천(BC 145년~BC 85? 중국 漢나라 역사가)은 위대한 저널리스트다. 흉노족에 포로로 끌려간 장군을 옹호하다가 치욕적인 궁형(宮刑: 고환까지 성기 절단)을 당한다. 사형이냐, 돈 내고 풀려나느냐, 궁형이냐를 놓고 번민하다 궁형을 택한다.
돈은 없다. 당시엔 가문의 명예가 중시돼 사형을 선택할 처지였지만 그는 살아서 저널리스트의 길을 택했다. 아버지와 자신으로 이어지는 2대째 계속된 역사서 기록이다. 그는 그렇게 살아남은 뒤 인류사에서 위대하고 독창적인 취재기를 남겼다. 그게 ‘사기(史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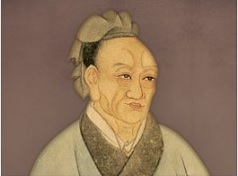
사마천의 취재방식은 현장답사와 현장 이야기, 그 당시 기준으로 고고학 발굴을 동원해 취재기를 써내려갔다. 여섯 차례 중국 땅을 여행(답사)했다. 기록도 독특하다. 공자를 제후의 위상으로 올리고 반란군 우두머리도 동격으로 치켜세웠다. 자객, 동성애자, 코미디언의 삶도 깊이 있게 취재했다. 파격에 파격의 연속이었다. 사람 냄새나는 휴머니즘의 진수를 발굴해 기록으로 남겼다. 현장에서 확인하며 팩트(fact)를 중시한 동서양 통틀어 저널리즘의 선구자다.
조선이 발해 주변 만주에 있었다는 증거 제시
한나라가 조선을 왜 공격했을까? 당시 조선(위만)은 한나라, 흉노와 더불어 천하(동북아시아)를 3분하고 있었다. 흉노의 기병은 무적이었다. 지금이라면 첨단 무기다. 한나라는 흉노에 여자와 비단을 공물로 바치며 전쟁을 피했다. 한나라의 명장이던 이릉장군도 흉노정벌에 나섰다가 포로가 되었고 이릉을 변호하다 사마천은 궁형을 당했다. 흉노에 시달린 한나라는 조선이 흉노와 손잡지 않을까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예상하며 전전긍긍했다(흉노의 철제 유물이 신라와 가야 유적지에서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다).
한나라 무제(재위: BC 141년~87년)는 드디어 조선 정벌을 명령한다. 공격에 나선 군부대 이동로를 보자. 주력군은 수군과 육군으로 나뉘어 출정한다. 육군은 요동에서, 수군은 지금의 산동지역인 제(齊)에서 출발해 배를 타고 발해를 건너 침공한다. 발해를 건너면 발해 맞은 편 땅에 도착한다.
遣樓船將軍楊僕從齊浮渤海, 兵五萬人, 左將軍荀彘出遼東(史記 朝鮮列傳)
산동반도에서 출발해 발해를 건넜다는 수군의 공격로는 당연히 건너편 연안일 수밖에 없다. 육군은 요동에서 출발했다고 기록돼 있다. 고대 중국인들에게 요동(遼東)은 지금의 극동(極東 가장 동쪽 끝)의 뜻을 지녔다. 동쪽 국경이 이동하면 요동의 위치도 변했다. 사마천이 살아 있었던 때의 요동은 지금의 북경에서 가까운 난하(灤河)다.
즉 육군은 북경 근처에서 출정했고 수군은 산동지역에서 발해를 건넜기 때문에 육군과 수군이 만나는 공격목표지점은 발해 연안에 위치한 만주 땅이다. 저널리스트 사마천이 가리키는 진격로와 공격지점은 해변에서 멀지 않은 만주 땅을 향하고 있다. 설령 요동의 위치가 달라지더라도 수군의 진격로를 보면 목표지점은 만주 땅임을 금방 알 수 있다.
승리한 한나라 장수 모두 처형 팩트 기록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한나라 장수들은 모두 사형을 당한다. 그것도 길거리에서 목을 베고 시신도 길거리에 내버리는 형벌이다(棄市). 저널리스트 사마천은 출정에 나선 모든 장수들의 비참한 말로와 함께 양복(楊僕) 한 사람만 많은 돈을 바치고 서인으로 겨우 살아남게 된 과정을 취재했다.
반면 항복했다는 조선의 지배층에게는 모두 벼슬(侯)이 주어진 사실을 솔직하게 기록에 남겼다. 조-한전쟁의 원인과 과정, 결과를 되짚어 봐야할 시사점을 준다. 원전으로 역사를 읽어야할 이유이기도 하다. 사마천이 살아있을 때 벌어진 일들이다.
사마천은 조선이 국방력을 갖춘 튼튼한 나라임을(固)을 예리하게 간파했다. 한나라 군대는 죽기 살기로 달려드는 죄수군단이었다. 이겨 돌아오면 풀려나기 때문이다. 두 해(BC 109년~BC 108년)에 걸친 전쟁 결과 한나라 군대만 번번이 패한 내용뿐이다.
결국 장수들도 사형 당하고 전쟁은 끝난다. 사마천은 장수들 중에 제후가 된 자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다. 조선 지배층에 한 무제가 내려줬다는 땅의 위치도 중요하다. 사마천은 산동반도에서 발해를 끼고 있는 만주 땅을 꼽고 있다. 항복했으니 항복한 땅을 떼 준 것 뿐이다. 지금으로부터 2,100여 년 전 저널리스트의 생생한 취재 내용이다. 사마천이 살아 생전의 일이기 때문에 생생할 수밖에 없다.
조선총독부의 사마천 취재기록 비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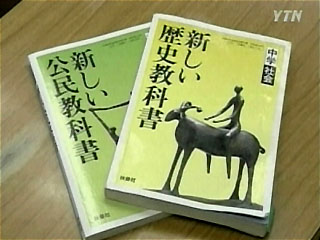
조선을 침략한 조선총독부는 우리 민족의 저항의지를 꺾기 위해서 식민지배 논리를 만들어내는데 성공했다. 남의 도움 속에서만 살아갈 수 있는 의존적이고 타율적인 민족성을 지녔다는 것이다(타율성 이론). 그 정책에 따라 우리 역사의 시작을 ‘한나라 400년 식민지(한사군)’로 날조했다.
2,100여년 전 저널리스트의 피땀으로 써내려간 원전(原典)을 비트는 작업이었다. 이른바 한사군 한반도 북부설이다. 핵심내용은 조-한 전쟁터를 대동강 일대로, 전쟁 후 한사군을 평양 주변을 중심으로 배치했다. 대동강 근처에서 벌어진 전쟁에서 패한 적국 신하들에게 중국 산동, 북경 근처, 발해 연안 땅을 주겠는가? 사마천이 통탄할 일이다.
400년 식민지 통치까지 받았단다. 장기간 식민통치는 언어를 통째로 바꾸었을 것이다. 그런 흔적과 기록은 단 한 줄도, 어느 한 곳도 없다. 그러나 그렇게 날조했다. 심지어 일제 조선침략 당시 북경 거리에 나도는 유물들을 가져다가 평양에서 발굴했다고 선전하며 고대 식민지의 증거라고 선전하기도 했다. 조선인들이 앞장 서 증언하도록 조선인 부역자도 키웠다. 조선총독부 요원으로 시작해 국사학계에서 대성한 이병도 등이다.
해방이 두려웠던 조선인 학자들의 승승장구

그들은 해방이 두려웠다. 그러나 미군정과 이승만의 친일 매국자 우대방침에 따라 승승장구한다. 사마천 취재기도 제대로 읽을 줄 모르는(원전 해독) 지금의 젊은 학자들은 가칭 ‘총독부학파’를 떠받치고 있다. 원전을 보더라도 조선총독부의 관점으로 사마천의 기록을 비틀어 놓은 해석본에 매달리고 있다.
사마천의 취재기(史記)는 원전에 밝은 독립운동가(신채호, 박은식, 정인보, 이상룡 등)와 남북한의 석학들(김석형, 리지린, 윤내현, 이덕일 등)에 의해 제대로 읽히기 시작했다. 시민들도 덩달아 탐독하고 있다. 조선총독부가 오염시킨 사마천의 취재기록, 소위 학자들만 쉬쉬하며 보던 엉터리 해석이 다 들통 나고 만 세상이 됐다.
시민-‘총독부 학파’ 한국사 연구 역전현상
진정한 저널리스트의 글은 힘이 있고 간결하다. 사마천의 취재기가 그렇다. 한나라에 부끄러운 점을 있는 그대로 남겼다. 적국 조선의 상황도 군더더기 없이 적었다. 일본인 논문에 길들여진 ‘총독부 학파’는 어거지식 해석(誤讀)과 어거지식 위치(比定)를 놓고 스스로 혼란에 빠져 있다. 똑똑한 시민들은 소위 학자들 머리 위에 올라섰다. 이제 시민들이 학자들을 혼내고 가르치는 상황이 됐다. 일제의 프레임에 갇힌 ‘총독부 학파’가 위기에 몰리고 있다. 조선총독부의 충실한 제자들은 궁형을 무릅쓰며 취재기를 남긴 사마천이 원망스러울 뿐이다.
조선시대 지식인들은 중국 대륙과 만주벌판을 누가 지배하느냐에 따라 사마천의 기록을 시류에 따라 해석했다. 사대주의의 함정에 빠진 게 그것이다. 조선을 침략한 일제는 영구 지배를 목적으로 일본인 지식인을 동원했고 조선인을 후계자로 키웠다.
모두 ‘제조된 지식인들(manufactured Intellectuals)’이다. 지금의 소위 역사 교수들도 일제가 세뇌 목적으로 정교하게 짜놓은 ‘틀에 갇힌 지식인들(framed Intellectuals)’일 뿐이다. 반면 시민들은 있는 그대로 저널리스트의 기록을 읽었다. 시민들은 일제가 조작하고 가짜 지식인들이 구축한 거대한 틀을 부수고 있다. 지식의 역전현상이요 지식의 민주혁명이다.
사마천 저널리즘 vs ‘총독부 학파’의 식민사관

주류로 행세하려는 ‘총독부 학파’의 얕은 지식, 식민지배 목적의 선행 연구에 맹종하는 비학문적 태도는 금방 바닥을 드러낸다. 역사는 기록한 자의 의도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역사는 기록자의 의도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이는 역사학을 하려면 반드시 알아야할 기본 상식이다(E H Carr 1892~1982년). ‘총독부 학파’는 상식조차 외면한다. 밥은 상식보다 앞선다.
사마천은 휴머니즘의 바탕아래 자신이 보고 느낀 대로 52만 6,500자의 취재 기록(史記)를 남겼다. 2,100여년 전의 일이다. 반면 지금의 ‘총독부학파’ 학자들은 일제가 날조한 역사연구를 생각 없이 따라가고 있다. 날조가 이뤄진 것은 겨우 백여 년 전 일이다.
해방된 지 76년이 지난 지금도 그들은 조선총독부의 역사연구에 부역하고 있다. 해방은 되었지만 한국사는 여전히 조선총독부가 지배하고 있다. 위대한 저널리스트 사마천의 기록을 소위 역사학자들도 제대로 읽는 역사 해방의 날을 기약해본다.
/김명성 논설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