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철의 '의학 에세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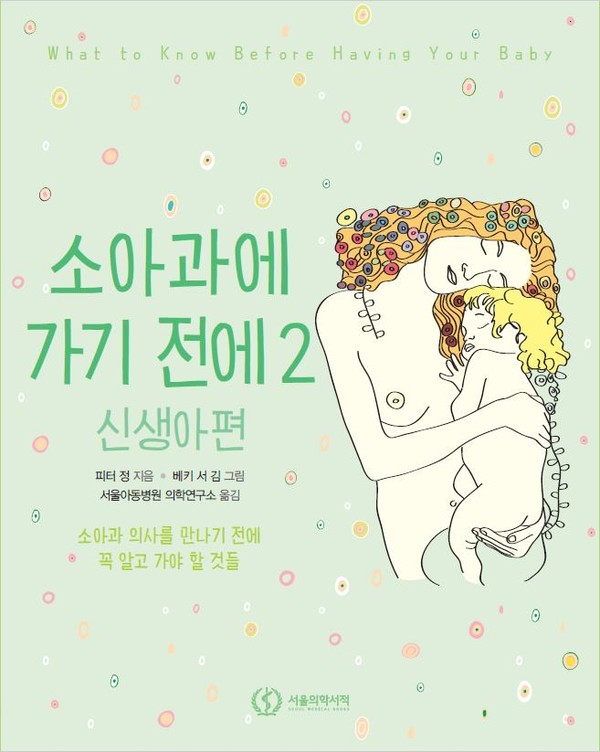
나는 의도했든 그렇지 않든 부모에게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모든 이론에 화가 난다. '내면아이' 같은 사이비 이론은 말할 것도 없고, 별 근거도 없이 아이에게 이런 말을 해야 하며, 저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육아 조언들이 몹시 불편하다. 어떻게 포장하든 그건 행동주의적 접근, 즉 보상과 처벌로 귀결된다. 개라면 그런 접근이 통할 것이다. 인간은 그럴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인간은 A를 해준다고 반드시 B가 나오는 존재가 아니다. 소위 육아 조언은 무의식중에 그런 구도를 만들어낸다. '아, 내가 그때 그렇게 말했어야 했는데!', '그때 그렇게 행동하지 말았어야 했는데!'라는 생각은 필연적으로 죄책감을 불러들인다. 그러다 보니 오늘날 육아는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 되고 말았다. 여성은 직업과 가사노동은 물론, 24시간 아이를 "정의롭게" 대하는지 자기검열을 해야 하는 처지에 내몰리고 말았다. 신경쇠약에 걸리지 않을 도리가 있을까?
가소로운 것은 소위 육아 조언을 제공한다는 전문가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몹시 공감한다는 표정을 지으며 '너무 완벽하게 키우려고 하지 말 것'을 주문한다는 점이다. 자애로운 전문가 코스프레가 끝나면 온갖 사례를 들고나와 분석하고 충고하고 모델을 제시한다. 인기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이를 키우는 데 모델은 없다. 물론 아이를 존중해야 한다. 그러나 자식을 키우다 보면 소리도 지르고, 등짝 스매싱도 하고, 미처 대답할 준비가 안 되었으면 엄마아빠가 손을 잡았더니 네가 생겨서 배꼽으로 낳았다고 해도 별 문제 없다. 문제는 그렇게 하면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큰 죄라도 짓는 것처럼 몰고가는 분위기에 있다. 이런 어리석은 짓의 뿌리가 상업주의에 있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연전에 책을 내고 인터뷰했던 내용 중에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이 있어 첨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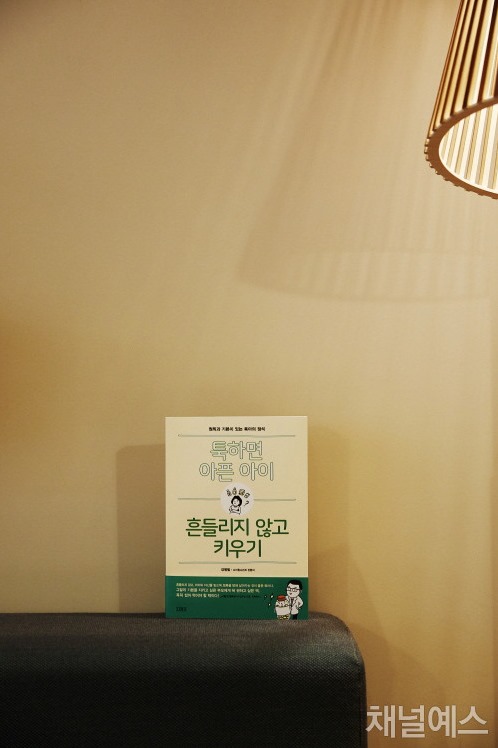
세 딸의 아버지이신데요. 자녀를 키우며 꼭 지키는 원칙이 있나요?
‘모든 사람은 다르다’ ‘모든 사람은 존귀하다’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에는 내 자식도 들어가죠. 결국 자식은 내 삶에 들어온 손님일 뿐이니 아이의 삶을 기획하지 않으려 해요. 이걸 둘째아이 초등학생 무렵에 깨달았어요. 아이의 키가 크지 않아서 성장호르몬을 맞히느냐 마느냐를 놓고 한 달을 고민했거든요.
소아과를 하고 있었으니 언제라도 약을 살 수 있고, 주사를 놓을 수 있고, 부작용도 모니터링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의 키가 크면 좋은가?’ ‘키 작은 사람보다 행복한가?’라고 자문해보니, ‘아이의 삶에 내가 의학적으로 개입한다면 아이의 다른 측면이 내 성에 차지 않을 때도 전부 개입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건 아이가 자기 삶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부터 모든 걸 내려놨어요. ‘아이에게 잘해준다’는 게 뭔지부터 다시 생각했죠.
그걸 알면서도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들보다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문득 불안해지는 게 부모인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우리나라는 기준이라는 것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런데 사회적 기준은 전부 남이 만든 거예요. 그걸 만족시키려고 애쓰면 그렇지 못했을 때 자꾸 밀려나는 기분이 들어요. 어떤 기준에 맞춰 완벽한 아이를 만들겠다는 욕망이 생기는 순간 불안하고 절박해지죠. 그럼 ‘이렇게 하면 아이 키가 클 거야’ ‘이렇게 하면 똑똑해질 거야’ 같은 말에 자꾸 속아요. 옳은지 그른지 판단할 여유가 없으니까요.
저는 아이들에게 딱 한 마디만 해요. 남의 욕망을 욕망하지 말라고요. 뭘 원하는지는 스스로 깨달아야 하고, 그건 엄마아빠가 찾아줄 수 없다고 하죠. 부모는 아이가 되도록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돼요. 안전한 범위 내에서 아이가 최대한의 경험을 할 수 있게 울타리를 넓게 쳐줄수록 더 좋은 부모라고 생각해요.
아이가 조금이라도 아프면 부모는 자책하게 돼요.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들려줄 말씀이 있을까요.
저는 육아에서 가장 나쁜 감정이 죄책감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본인에게도 해롭지만 아이에게도 해로워요. 아이는 절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크지 않아요. 아이의 삶에 부모가 미치는 영향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적고요.
『위대한 남자들도 자식 때문에 울었다』는 책을 보면 간디 자식도 형편없었대요.(웃음) 그러니 본인이 아이의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며 죄책감 느낄 필요도 없고요. 다만 아이가 커가면서 맞닥뜨리는 사회의 모든 것에 영향을 받으니, 환경과 사회의 문제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자식만 바라본다고 내 자식이 잘 되는 게 아니니까요. 남녀가 평등한 세상, 빈부격차가 적은 세상, 미세먼지가 없는 세상에서 우리 아이가 자란다면 훨씬 행복하고 훌륭하게 자라지 않겠어요? 그러니 좋은 육아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사회를 바꾸는 데 동참하는 젊은 부모가 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글·사진=강병철(소아과 전문의·꿈꿀자유 서울의학서적 기획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