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종의 '역사칼럼'

러시아는 아직도 전쟁 중이다. 평화는 그들로부터 너무 먼 곳에 있다. 일찍이 레프 톨스토이는 <<전쟁과 평화>>에서 평화에 대한 갈망을 노래했다. 러시아의 역사를 뒤적여보면 전쟁의 폭력적인 얼굴이 여러 번 나타난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악몽은 제2차 세계대전이 아니었을까. 히틀러의 '말살전쟁'(독어 Vernichtungskrieg)은 이름만 들어도 흉측하다. 나치의 3백만 대군이 닥치는 대로 살인과 방화를 일삼았다. 그들은 스탈린의 공산 정권을 ‘유대인 볼셰비즘’이라 비난하며, 슬라브인과 유대인, 신티와 로마를 박멸하려 했다.
나치는 장차 러시아의 상당부분을 독일인 거주 지역으로 바꿀 셈이었다. 독일민족의 ‘생존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전쟁이라는 합리화가 되풀이 되었다. 실제의 목적은 따로 있었다고도 한다. 나치가 장기간 전쟁을 수행하려면 유류 보급이 원활해야 했다. 러시아와의 평화협정을 일방적으로 깨고 독일이 전쟁을 벌인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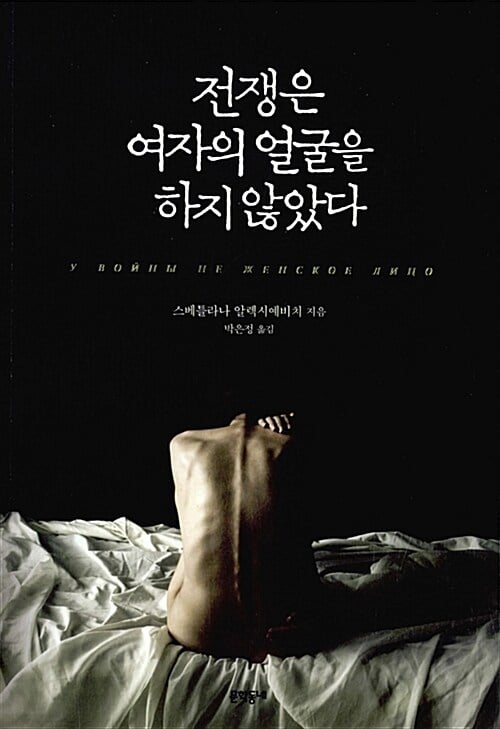
그럴 듯한 해석이다. 전쟁 초반 전세는 독일군에게 유리했다. 그러나 전쟁이 장기화되자 모든 것이 달라졌다. 미국은 소련 측에게 군사 장비를 대폭 지원했다. 또, 스탈린도 우랄 산맥 동쪽으로 군수공장을 이전해 필요한 무기를 대량으로 생산하였다.
게다가 히틀러 군대의 잔학한 범죄행위에 분노한 러시아 인들이 팔을 걷고 나섰다. 피정복지의 주민들도 게릴라 활동으로 맞섰다. 결과적으로, 1941~1942년이 되면 히틀러의 동부 전선은 이미 무너지기 시작했다.
2015년의 노벨문학상 수상자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국적 벨라루스)는 처참하기만 했던 동부전선의 실상을 기록하였다.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는 다큐멘터리 소설이다. 작가는 200여 명의 참전 여성들을 만나 회고담을 채록하였다. 그때 동부전선에는 1백만 명 이상의 러시아 여성이 전쟁을 수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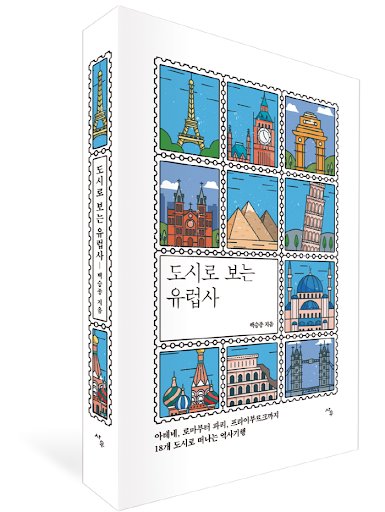
작가는 여성의 시각에서 전쟁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었다. 평화롭게 살고 있으면서도 언제나 일촉즉발의 위기 속에 있는 우리로서는 누구보다 평화를 갈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출처: 백승종, <<도시로 보는 유럽사>>(사우, 2020)
/백승종(역사학자, 전 서강대 사학과 교수, 현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겸임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