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종의 '역사칼럼'
기후는 인간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 문명이 고도로 발달한 오늘날에도 변하지 않는 철칙이다. 기후위기에 대한 걱정이 없을 수 없어, 2015년 12월 12일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195개 국가가 파리기후변화협약을 체결했다.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지구온난화를 극복하자는 것이었다(2017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탈퇴 선언으로 파리협약은 위기에 빠졌으나 2021년 조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으로 상황은 다시 역전되었다).

역사를 살펴보면 지구의 평균기온이 현재보다 2도나 높았던 적도 있다. 10세기부터 13세기까지였다. 그때를 ‘중세 온난기’라고 부른다. 현대인은 온난화를 두려워하지만 중세 유럽사회는 달랐다.
고온의 영향으로 농사 한계선이 200미터나 높아져, 웬만한 산중턱에도 농사가 가능해졌다. 그러자 기득권층인 기독교회와 귀족들이 앞다퉈 개발붐을 일으켰다.
많은 농노(農奴)들이 산지를 개간하는 데 투입되었다. 농노는 자유가 제한되어 있었으나, 조선시대로 치면 노비보다는 평민에 가까웠다. 하여간 중부 유럽에서는 지배자들이 농노들을 이용해 ‘내부 식민화’에 열을 올렸다. 유럽 역사에서 그때처럼 농노의 경제적 가치가 높은 적은 없었을 것이다. 동원할 수 있는 농노의 수가 많으면 새로운 농토를 얼마든지 개간할 수 있는 시기였다.
유럽의 산과 골짜기에 마을과 도시, 그리고 성채가 새로 건설되었다. 내가 젊은 시절을 보낸 독일 서남부에는 지명 속에 중세 온난기의 개발 열기가 아로새겨져 있다. 튀빙겐이라는 대학도시부터가 그랬다. 중세의 유풍이 아직 남아 있는 그곳의 역사는 1191년에 시작되었다. 독일의 마지막 황제 빌헬름 2세의 조상들, 곧 호엔촐러(Hohenzoller) 가문의 발상지인 헤힝겐에 성채가 완공된 것도 1255년의 일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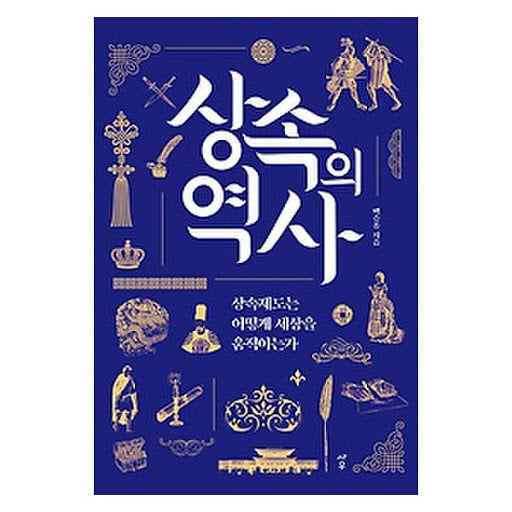
독일 지명이 ‘잉겐’으로 끝나면, 중세 온난기에 등장한 곳으로 봐도 좋을 정도다.농노들이 투입된 유럽의 개간사업은 성공적이었다. 9세기 유럽 인구는 3000만 명쯤이었는데, 13세기에는 두 배 이상 늘어 7300만 명이 되었다.
그러나 14세기에 페스트가 유행하고 소빙기가 찾아와, 인구가 급감하고 개간이 불가능해졌다. 그때까지 유럽 역사의 방향을 튼 것은 말없이 땀흘리며 개간에 종사한 농노들이었다.
※출처: 백승종, <<상속의 역사>>(사우, 2019)
/백승종(역사학자, 전 서강대 사학과 교수, 현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겸임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