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수의 '세평'
한국 사회 ‘지식인의 사회 교란’ 전형으로 나는 전 고려대 교수 최장집을 꼽는다. 나는 그를 잘 포장된 ’진중권 수준’으로 본다. 이는 모욕이 아니다.
궤변을 일본식 한자어로 늘어놓는 빈 껍데기가 최장집 실체다. 그래서 나는 ‘엘리트주의’에 빠져 ‘정치 학자연’하는 그의 모습에, 구역(嘔逆)질이 난다.
제주도에서 뭔 강연을 했다고 조선일보부터 언론 표방 참칭 매체들이 일제히 받아쓰기로 보도했다. 내용의 요지는 이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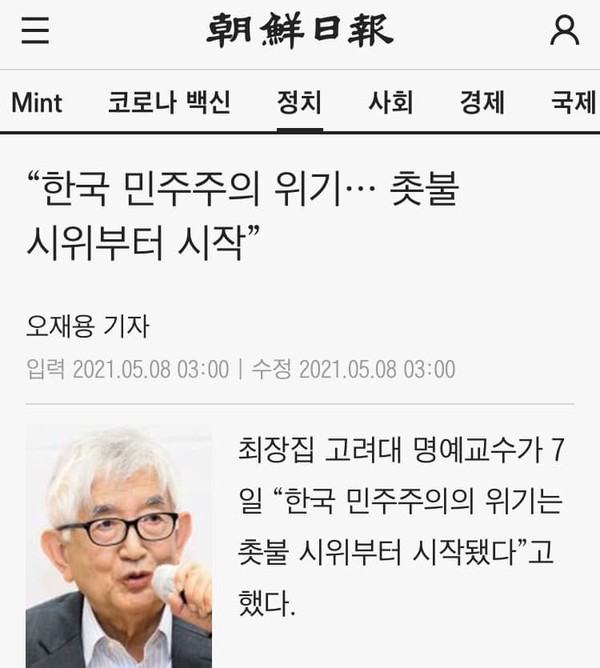
“지금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는 촛불 시위에서 비롯됐다. 촛불 시위를 통해 그동안의 진보와 보수 세력의 균형이 붕괴된 것이 위기의 중심이다.
촛불 시위의 기대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개돼서 건강한 발전에 기여했으면 좋았을 텐데, 현실적으로는 포퓰리스트 민주주의로 퇴행하고 위기라고 말할 정도로 민주주의에 도전을 경험하게 됐다. 촛불 시위 자체에 비판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촛불 시위를 혁명으로 이해한 것이 건강한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1980년대 민주화 운동으로 성립된 87년 체제를 민주화 세력에 의해서만 된 것이 아니라 보수적 엘리트들이 민주화에 동의를 해서 이뤄진 암묵적 협약으로 이는 협약에 의한 민주주의였다. 촛불 시위는 이 '협약에 의한 민주주의'가 붕괴된 계기였다. 민주당 정부는 광범위하고 급진적인 슬로건과 개혁 목표를 내걸고 촛불 시위를 혁명으로 정의했다.
대표적으로 적폐청산, 즉 과거에 대한 청산 운동을 표방했다. 촛불 시위를 혁명으로 정의했기 때문에, 과도하게 폭넓고 과거를 부정하는 문제를 포괄하게 됐다. 특히 보수 세력을 부정적으로 평가해 청산하는 것이 적폐청산이라고 했다.
이로 인해 보수 세력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결과를 가져와 보수가 민주주의를 수용해 이뤄진 협약의 의미가 해체됐다. 아울러 보수, 진보 간 정치적 갈등의 강도가 높아지고, 사회적으로도 폭넓은 갈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 촛불 시위 이후 정치현상의 특징이다.
대의제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직접 민주주의적 욕구가 강해지면서 깨어있는 시민이나 '촛불 시민' 같은 특별한 사람들이 선도적으로 정치 영역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영역에서 민주주의를 이끌어가야 한다는 발상이 강조되는 결과가 됐다.
모든 시민들이 깨어있는 시민이 돼서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역할을 떠맡도록 만드는 것은 온 사회를 정치화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는 매우 위험한 민주주의 이해 방식이다. 정치적 갈등은 국회라는 제도화된 공론장에 제한돼야 함에도, 온 사회로 확장되면 사회적 분열과 갈등을 만들어냈다.”
최장집의 사고에서 민주주의는 ‘선택된 집단’(국회)이 지배하는 형식만이 민주주의라고 떠든다. 말이 ‘의회 민주주의’이지 형식과 달리 본질은 ‘이전투구의 장’인 국회 현실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
최장집이 말하는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특히 그의 주장에서 전제인 “보수” “진보” 상정의 프레임이야말로 가짜 프레임으로 허상이고 관념이다. 민족반역에, 학살에, 군사반란에 더한 세력을 “보수”라고 사회 가치화 시키는 것이야말로 위험한 착란이다.
그는 사실과 현실을 보지 않고 관념의 민주주의를 말하는데, 과두체제 지배 현실은 민주주의가 결코 아니다. 정치의 장이란 더 넓게 더 많이 열리는 것이 세계의 추세이고 직접 민주주의 원활한 계발이 인류의 지향이다. 민주주의는 낡은 고정태로 썩은 무리들의 이합집산을 깨트리고 쇄신시키면서 때로는 뒤집어 엎고 새 판을 짜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것이 민주주의다.
최장집의 주장에 정색하고 이론과 논리로 논박할 필요는 없다. 문제는 저 수준이 ‘정치 학자’로 언필칭 ‘원로’로 유통되는 사회란, 지식의 수준에서 너무 빈약하고 얇다는 현실이다.
김대중 시기 조선일보가 주동한 ‘빨갱이 사냥’으로 청와대에서 강퇴, 이후 조선일보에 단골 인터뷰로 자주 등장해 조선일보 이데올로그가 됐다. 현실 정치판에도 기웃거리는데 안철수 멘토를 자처했던 그 수준 딱 그다.
/김상수(작가·연출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