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종의 '역사칼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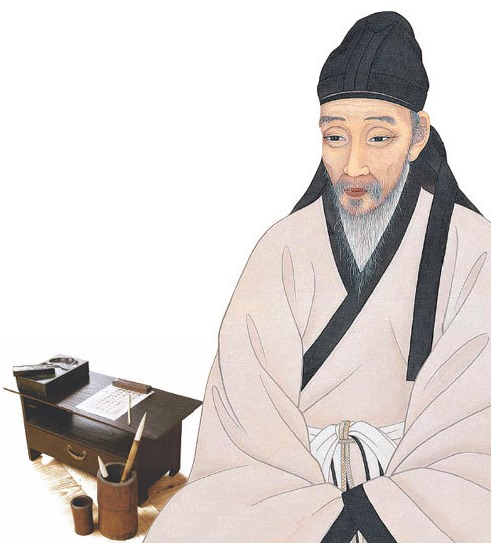
이황은 34세 되던 1534년(중종 29) 문과시험에 급제했다. 그런데 그의 벼슬길은 순탄하지 않았다. 처가 안동권씨 집안의 영향이 있었다.
장인 권질은 기묘사화(1519)에 희생된 정언 권전(權磌)의 친형이었다. 그 때문에 권력층은 이황을 꺼렸다. 또, 이황은 세력가 김안로의 면담요청을 거절해 미움을 샀다. 나중에는 그의 친형 이해(李瀣,1496-1550, 호는 溫溪)도 김안로의 모함에 걸려 유배 길에서 객사하였다.
혼탁한 세상에 그는 어울리지 않았다. 일찍이 그의 모친 박씨는, “높은 벼슬에 나아가지 말라. 세상이 너를 용납하지 않을까 두렵다.”(<언행록>, 제2권)고 앞일을 내다보았다. 이미 어렸을 적에 어머니는 아들이 어떤 사람일 줄을 정확히 알고 계셨다.
그런데 학자로서 명성이 자자해지자 그에게는 관직이 거듭 주어졌다. 그러나 이황의 뜻은 부귀공명을 벗어나 있었다. 43세 되던 1543년(중종38), 친구 김인후를 전송한 시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였다.
“부귀영화란 내게 뜬구름과 같은 것이라오.”

권세를 탐하는 요즘 풍속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황은 50세 때 퇴계 서쪽에 자리를 잡았다. 그의 발걸음이 더러 조정에 미쳤으나, 마음은 늘 전원에 있었다.
1570년(선조3), 70세가 된 이황은 몸이 예전과 같지 않음을 느끼고, 세상 떠날 준비를 하였다. 별세하기 엿새 전, 그는 사람들에게 빌린 책을 되돌려주었다. 나흘 전에는 제자들과 작별인사를 나눴다.
“내가 그동안 잘못된 견해로 제군들을 종일토록 가르쳤구나.”(<언행록>, 제5권)
먼 길을 떠날 날이 되자 평소 아끼던 매화 화분에 물을 듬뿍 주게 하였다. 얼마 뒤 그는 똑바로 앉은 채 운명했다.(<언행록>, 제5권)
배움이 없는 백성과 종들도 애도하였다. 여러 날 동안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도 많았다. 장례에는 사대부만 해도 3백 명이 모였다. 그는 한 시대의 아버지였다.
출처: 백승종, <<조선의 아버지들>>(사우, 2016; 세종 우수교양도서)
사족:
"사람은 백번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서 언행과 성정이 여러 번 바뀐다는 뜻입니다. 조금 부족해 보이는 아이라도 포기하지 말고 정성껏 잘 기르라는 뜻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라고 해서, 좀체 바뀌지 않는 것이 사람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그만큼 사람이 달라지기가 어렵다는 말이겠지요.

"군자 표변"이라는 말도 있어서 군자는 자신의 잘못을 곧바로 고치는 법이라는 이야기도 있지요. 내적 자각의 중요성이랄까, 언행일치를 강조하는 표현이 아닐까 합니다.
어떻게 보든 사람을 제대로 키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실감합니다. 율곡 이이가 제자들에게 들려준 말에 따르면, 퇴계 이황도 젋어서는 "축색(蓄色)"을 하였다고 합니다. 요즘 말로 성애(性愛)를 지나치게 좋아했더라는 말인데요. 나이가 좀 든 뒤에는 매우 도덕적인 군자로 변하였다고 합니다. 아마 거짓은 아니었을 줄로 압니다.
바로 그 퇴계 선생이야말로 "만인의 사표"라는 진부한 표현을 무색하게 만드는, 실로 훌륭한 스승이셨지요. 어머니 박씨부인은 그가 이미 어렸을 적부터 아들이 장차 개결(介潔)한 학자로 자라날 줄 아셨다고 합니다. 위에 적은 바와 같습니다.
마침 오늘이 어버이날이라고 합니다. '나는 과연 부모님에게 어떤 아이였는지, 또 자식들에게는 어떤 부모인지'를 곰곰 생각하는 아침입니다.
/백승종(역사학자, 전 서강대 사학과 교수, 현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겸임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