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종의 '역사칼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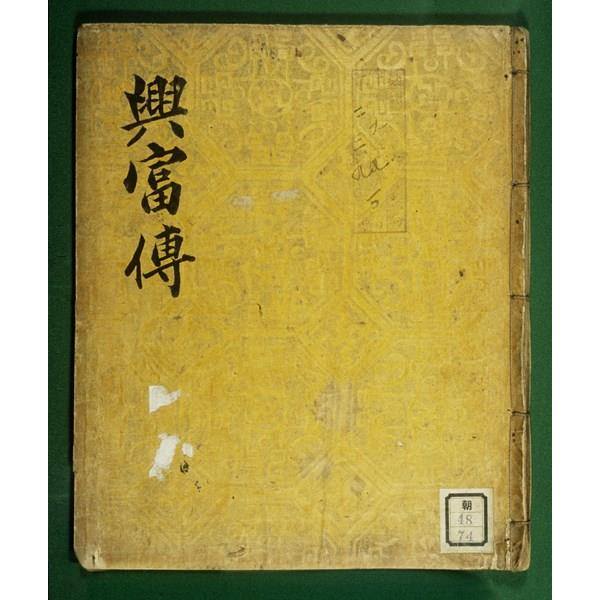
성리학이 지배하던 조선 사회에서도 상속을 둘러싼 친족 간의 불화가 끊이지 않았다. 1490년(성종 21) 전직 장악원정 임중은 성종에게 올린 상소문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토지와 노비를 두고 소송을 벌이는 사람들은 대개 형제이거나 삼촌 조카 사이입니다. 누가 잘못되었고 누가 옳은지를 저들 스스로도 잘 압니다. 그러나 약한 이를 업신여기며, 세력을 믿고 옳고 그름을 바꾸려고 서로 소송하기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골육骨肉을 해칩니다. 천륜을 더럽히고 어지럽게 만드는 것이 이보다 심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재판 과정에서 이치에 어긋난 점이 드러나고 간사한 흉계가 폭로된 사람은 온 식구를 변경으로 추방함이 옳습니다. 그러면 소송도 줄어들고 풍속도 도타워질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계책이 될 만합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 염두에 두옵소서.” (『성종실록』, 성종 21년 1월 24일)
성종이 임중의 제안을 따랐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때 성종은 이 상소문을 병조에 내려주며, 실행할 만한지를 검토해보라고 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명백한 사실은, 가까운 친족간에도 선대의 재물을 놓고 다툼을 벌이는 일이 많았다는 것이다.
세종의 조카사위도 상속 분쟁 일으켜
태평성세로 알려진 세종 때, 대제학이란 높은 벼슬을 지낸 이행의 아들과 손자들이 재산 싸움을 벌여 세상을 시끄럽게 했다. 1438년(세종 20) 8~11월의 『세종실록』에는 이 사건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왕명에 따라 의금부에서 수사한 사건의 개요는 아래와 같았다.
대제학 이행의 둘째 아들 이적李迹과 그의 큰조카 이자李孜가 사건의 중심에 있었다. 두 사람이 이행의 재산을 차지하려고 서로 아귀다툼을 벌인 것이었다.
사건의 발단은 아버지 이행과 둘째 아들의 불화였다. 어느 날 아버지가 편지를 보내 둘째 아들을 심하게 꾸짖었다. 그러자 둘째 아들도 편지로 항변했는데, 언사가 몹시 불손했다. 아버지는 화를 내며 둘째 아들의 불효를 꾸짖고 차후 토지든 집이든 노비든 아무것도 주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행은 이 사실을 큰손자(이자)와 서자(몽가蒙哥)에게도 편지를 보내 알렸다. 그런데 훗날 아버지와 둘째 아들이 다시 관계를 회복하였다고 전한다.
아버지가 사망하자 문제가 일어났다. 큰손자는 과거에 조부가 써준 유서遺書를 근거로 노비와 전택을 모두 자신이 차지하려 했다. 그러자 둘째 아들이 불복했다. 그는 생전에 아버지(이행)가 친필로 자신에게 써준 문서를 꺼내놓으며, 큰조카(자)를 비롯해 여러 자녀가 재산을 골고루 나누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처음에는 그의 말대로 아버지의 재산이 일단 균등하게 분할되었다.
그러나 큰조카(이자)는 이 점을 매우 억울하게 생각했다. 그는 작은아버지(이적)가 제시한 문서는 조작되었으리라고 의심해, 드디어는 사헌부에 소송을 제기했다. 오래전 할아버지가 자신에게 준 글을 인용하며, 이자는 작은아버지가 할아버지에게 불효한 사실을 들추어냈다. 그러자 둘째 아들은 큰조카가 집안의 제사를 성실히 지내지 않은 점을 비판하고, 심지어 신주를 불태운 적이 있다며 맞불을 놓았다.
사헌부에서는 양쪽을 문제 삼았다. 그들이 친족 간에 서로 화목하지 못한 점, 큰손자가 조상의 신주를 불태운 죄를 모두 엄하게 다스리자고 입장이 정리되었다. 문제가 점점 심각해졌다. 세종은 의금부에 명하여 이 사건을 더욱더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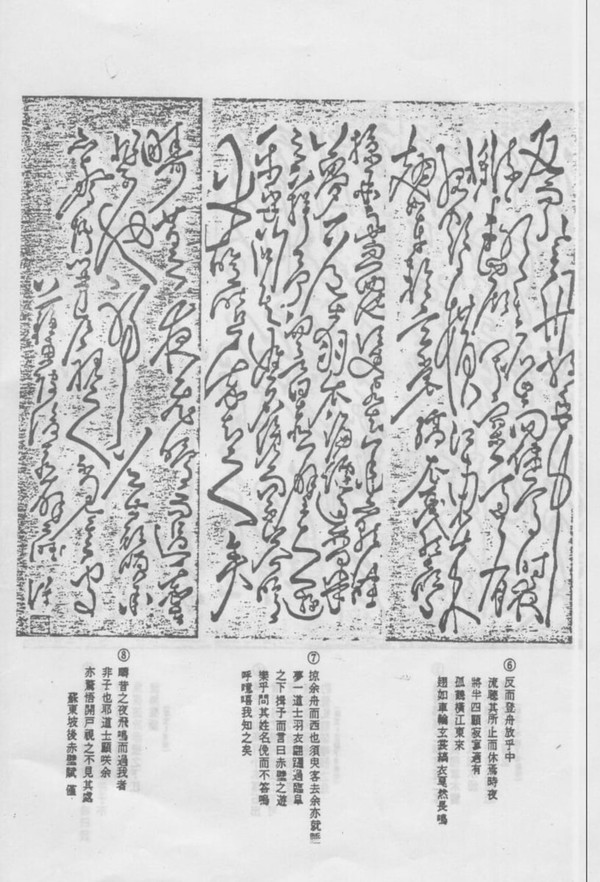
의금부에서 집중적으로 수사한 결과, 진상이 밝혀졌다. 과거에 둘째 아들 이적은 자신의 아버지에게 아들로서는 감히 할 수 없는 말을 한 것이 사실이었다. 이는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였다. 게다가 그가 제시한 아버지의 유서, 즉 재산을 자손들이 똑같이 나눠 가지라는 유서도 가짜임이 드러났다.
큰손자(이자)도 문서를 변조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는 서 삼촌 몽가와 협의하여, 할아버지 이행이 그들에게 준 문서의 작성 연도를 변조했다. 작은아버지 이적이 제시한 할아버지의 유서를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두 사람의 죄는 태형 80대에 해당했다.
세종은 어떤 처분을 내렸을까? 왕은 그들의 죄를 조금씩 감해주었다. 이행의 큰손자와 서자 몽가는 경미한 처벌을 받았고, 둘째 아들 이적은 함길도 경원부로 귀양 보내기로 하였다.
이적이 귀양길을 떠날 때도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 큰조카 이자가 그를 찾아가 심하게 비난했다. 그는 작은아버지를 협박하여, 그 수중에 남아 있던 약간의 재산까지도 자신에게 돌려주기를 강요했다. 그러면서 을러댔다. “숙부의 생명을 보전한 것이 누구의 힘입니까. 어찌 나의 덕이 아니겠소.”
이적의 큰조카인 이자는 양녕대군의 사위였다. 말하자면 세종의 조카사위였으니, 그는 왕실의 인척이었다. 그 당시 조선에서 가장 지체 높은 이들조차 이렇게 상속을 둘러싸고 법정 다툼을 벌이는 판이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15세기와 16세기 조선 사회에는 비일비재하였다. 그러나 17세기 이후에는 이런 사건이 등장하지 않는다. 그럼 상속을 둘러싼 갈등과 분란이 조선 사회에서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아도 좋을까? 성리학 사회의 위선에 가려졌을 뿐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우리가 잘 아는 고소설 『흥부전』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다. 소설의 주인공 흥부는 욕심꾸러기 형 놀부를 관헌에 고발하지 않았다. 말하자면 그것은 흥부의 높은 도덕성과 관련이 있기도 했고, 그 당시의 사회 분위기와도 깊이 관련되어 있었다.
장자 중심의 가부장적인 사회가 되고 말았기 때문이다. 아마도 조선 후기 『흥부전』의 독자들 가운데는 흥부와 처지가 비슷한 사람이 많았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억울한 흥부가, 결국 하늘의 보상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리만족을 느끼며, 자신의 슬픔을 달래지 않았을까 짐작해본다.
※출처: 백승종, <상속의 역사>, 사우, 2018
/백승종(역사학자, 전 서강대 사학과 교수, 현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겸임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