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종의 '역사칼럼'

스트라스부르에서 독일과 프랑스가 처음 충돌한 것은 842년이었다. 그때 ‘스트라스부르 서약’이란 문서가 작성되었다. 역사상 프랑스어로 쓴 최초의 공식문서였다. 이 문서는 라틴어에서 프랑스어가 갈라진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로서 언어학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문서의 주인공은 양국의 왕이었다. 루드비히 왕은 라인 강 동쪽을 다스리던 독일의 왕이요, 프랑스의 군주는 샤를이었다. 문서를 통해 두 왕은 평화공존을 약속했다. 이후 스트라스부르는 독일 즉 신성로마제국의 영토로 확인되었다(855년).
그러나 스트라스부르 사람들은 자유를 원했다. 1201년 그들은 자유도시로 인정받아 왕과 영주들의 간섭에서 벗어났다. 그 후 이 도시에서 문화가 꽃피었다. 대표적인 것이 고딕 양식으로 지은 노트르담대성당이다. 대성당은 13∼16세기에 축조되었는데(1225년 시작), 오늘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
좀 더 자세히 말해, 대성당의 성가대와 현관은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지어졌다. 그에 비해 대성당의 서쪽 면은 웅장한 고딕 양식이다. 그럴 것이 대성당의 공사를 맡은 건축가와 석공들이 프랑스 북서부에서 고딕문화에 익숙한 이들이었으니 말이다.
특히 이 건물을 장식한 스테인드글라스는 아름답기로 정평이 있다. 첨탑도 무려 142미터의 높이를 자랑한다. 1625년부터 1847년까지 노트르담대성당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다. 그런데 이곳에 또 하나의 걸작이 있다. 행성의 운행과 별자리까지도 한 눈에 보여주는 천문 시계이다. 현재의 시계는 19세기에 제작된 것이다. 그 이전에 사용하던 것은 스트라스부르의 장식예술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노트르담대성당은 물론 가톨릭교회였다. 하지만 1521년 종교개혁이 일어나자 프로테스탄트 교회로 바뀌었다. 그 후 1681년에 다시 변화가 일어났다. 프랑스가 이 지역을 점령하자 프랑스의 국가전통에 따라 가톨릭교회로 탈바꿈했다. 19세기 프랑스의 문호 빅토르 위고는 이 건물을 가리켜, “거대하면서도 섬세한 경이”라며 경탄했다.

중세 말부터는 이곳에서 미술도 발전했다. 이름난 화가가 여럿 배출되었는데 마르틴 숀가우어도 그 중 하나였다. 그는 판화작가이자 화가로 명성을 날렸다. 금세공사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다방면에 재능이 있었다. 르네상스 시기, 독일 최고의 화가였던 알브레히트 뒤러도 청년시절에 이 유명한 예술가를 만나기 위해 일부러 스트라스부르를 방문했다(1492년). 하지만 그때 숀가우어는 이미 저 세상 사람이 되어있었다.
숀가우어는 고딕의 전통에 충실하였다. 유려하면서도 뚜렷한 윤곽선을 구사하며 많은 종교화를 남긴 것이다. 대표작은 <장미 정원의 성모>였다(1473년). 성모 마리아를 간결한 필치로 묘사했는데 균형 잡힌 구도가 인상적이었다. 그는 원근법을 이용해 성모를 입체적으로 표현하는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스트라스부르는 중세부터 문학의 중심지로도 호평을 받았고, 출판업의 전통도 깊었다. 종교개혁의 시대에는 금속활자로 이름난 요하네스 구텐베르크도 이곳으로 이주하였다. 오늘날 구시가지에는 구텐베르크 광장이 있고, 그의 동상이 서있다. 구텐베르크는 여기서 마르틴 루터가 번역한 독일어 성경을 인쇄하였다. 16세기의 스트라스부르는 유럽 출판업의 중심지였다.

거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역사적 배경이 있었다. 1201년 신성로마제국의 카를 4세가 이 도시에 자유제국도시라는 지위를 주었다.
때문에 봉건영주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자유를 누리게 된 것이었다. 자유스런 분위기 덕분에 이 도시는 학문, 예술 및 출판이 번영을 누렸다.
문화도시 스트라스부르, 그 활기는 오래도록 이어졌다. 근대 독일의 문호 요한 볼프강 폰 괴테도 젊은 시절을 이 도시에서 보냈다. 또 하나, 기억할 점이 있다. 프랑스의 국가 “라 마르세예즈(La Marseillaise)” 역시 이 도시에서 탄생하였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너무 과장하지 말자. 인간이란 합리적이고 평화로운 존재로만 볼 수 없다. 때로 광기에 사로잡혀 큰 죄악을 연출한다. 스트라스부르의 역사에도 그러한 굴절이 있었다. 끔찍한 유대인 박해 사건이 바로 이곳에서 일어났다.
14세기 유럽에 흑사병이 한창 유행할 때였다. 그때 이 도시에는 원거리 교역에 종사하는 부유한 유대인들이 많았다. 그런데 사람들은 유대인이 우물에 독극물을 풀어서 흑사병이 발생했다고 생각했다. 이런 뜬소문 때문에 여러 곳에서 유대인들이 공공의 적으로 몰렸다. 스트라스부르도 예외가 아니었다. 시민들은 무고한 유대인을 마구잡이로 체포해 수천 명을 학살했다. 이 도시의 시민들은 유대인들은 불구덩이에 던져 넣었다. 사태가 심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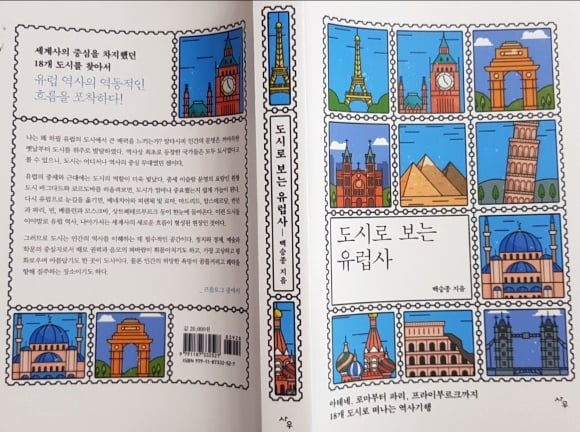
그 당시 교황 클레멘스 6세(재위 1342~1352)는 유럽인들의 야만에 경악했다. 교황은 유대인들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라는 취지의 공한을 각지로 발송했다(1348년 6월). 그럼에도, 유대인에 대한 집단적 폭력은 진정되지 않았다.
때로 인간은 광기를 뿜는다. 그때마다 세상은 속수무책이 되기 마련이다. 소수자에 대한 보호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스트라스부르의 유대인 학살사건이 경고한다.
※출처: 백승종, <도시로 보는 유럽사>(사우, 2020)
/백승종(역사학자, 전 서강대 사학과 교수, 현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겸임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