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종의 '역사칼럼'
율곡 이이에게 '서울 집'을 내준 이는 누구였을까?
중세 이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여성의 권리가 위축되었다. 그러자 상속제도에도 상당한 변화가 일어났다. 이제 어머니는 자신의 재산을 딸보다도 아들에게 더 많이 물려주는 경향을 보였다. 심지어 친아들이 없으면 자매의 아들, 곧 친정의 남자조카에게 넘겨주는 일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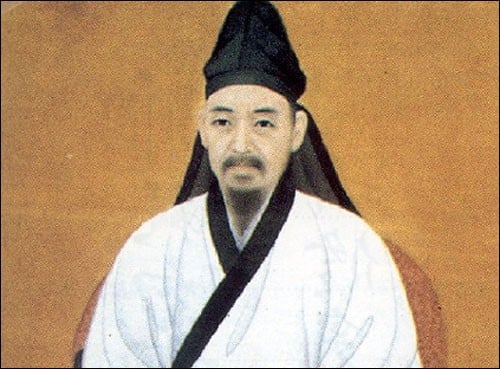
그러한 역사적 맥락에서 한국사회의 실례도 검토할 만하다. 조선 중기까지도 한국사회는 여성을 온전한 상속자로 인정하였다. 상류층 여성들은 재산권을 마음껏 행사하였다. 자신의 재산에 대해서는 독립적으로 상속자를 결정하였다. 그런데 16세기 후반이 되면 한국의 여성들도 여성보다는 남성을 상속자로서 더욱 선호하는 신경향을 보였다.
지금 내 머리에는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9호로 지정된 <이씨분재기>가 떠오른다. 1541-1561연간에 작성된 그 문서의 주역은 강릉에 살던 용인이씨라는 여성이다. 그녀는 사별한 남편(신명화)과 자신이 소유한 재산을 5명의 딸들에게 분배하였다. 문서에는 그런 사연이 빼곡히 기록되어 있다. 상속자들 가운데는 16세기의 대학자 율곡 이이 및 그 모친 신사임당이 포함되어 있어 흥미를 더해준다.
용인이씨는 이이의 외조모였다. 외조모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전·답·노비·가옥 등을 딸들에게 골고루 나눠주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다. 이미 노경에 접어든 용인이씨는 장차 자기가 죽은 다음에 제사를 외손자 현룡(見龍), 곧 이이에게 부탁한다고 했다.
그녀는 그 대가로 서울 수진방에 있던 집과 전답을 이이에게 특별히 지급하였다. 그 당시는 제사도 자식들이 돌아가며 모시는 ‘윤사’(輪祠)가 보편적이었는데, 이씨는 외손자 이이를 사실상 봉사손(奉祀孫)으로 지정하였다. 이이는 둘째 딸 신사임당의 7자녀 가운데 5번째였는데, 외조모는 그를 사실상 입양한 셈이었다.
또, 이씨는 묘소관리는 강릉에 살고 있는 외손자 운홍(雲鴻) 즉, 권처균(權處均, 이이의 이종사촌 동생, 호는 烏竹軒)에게 특별히 부탁하였다. 그녀는 권처균에게 강릉 북평촌에 있던 자택(오죽헌)과 전답을 주었다. 권처균은 용인이씨의 넷째 딸의 아들이었다.
외할머니 용인이씨에게는 모두 5명의 딸과 10명 이상의 외손자녀들이 있었다. 허나 그녀는 이 많은 후손들 가운데서 이이와 권처균을 특별히 지목하여, 집안의 제사와 묘소관리를 부탁했다. 그녀는 자신과 정서적 유대가 유난히 돈독했던 두 딸을 골랐고, 그들의 여러 외손자녀들 가운데서 두 명의 외손자를 선택해 많은 재산을 물려준 것이다.
겉으로 보면 5명의 딸들에게 부모의 재산을 골고루 나누어준 것처럼 보였으나, 엄밀한 의미에서는 차별 상속이었다. 용인이씨에게 가장 의미 깊은 귀중한 재산들, 즉 서울의 집과 강릉의 자택 등은 자신이 유달리 사랑한 외손자 2명에게 물려주었다.
상속제도는 ‘생존전략’

과연 누구를 상속자로 결정할까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일까? ‘생존전략’이란 관점에서 상속자를 정했던 것은 아닐까. 바로 그 선택에 따라 한 개인이 죽고 살며, 한 집단이 장차 존속하고 못하고가 결정되었다. 집단의 존속이라는 장래 문제를 염두에 두고 상속의 형식과 내용이 정해졌다고 하겠다.
그런데 생산성이 낮은 사회에서는 언제, 누구에게, 무엇을 나눠 줄 것인가를 결정하기에 앞서 언제, 누구에게, 무엇을 박탈할 것인가가 더욱 시급한 문제였다. 이것을 나는 “부정적 의미의 상속”이라고 부르고 싶은데, 집단의 생사를 좌우하는 중요한 결정이었다.
혹심한 기근이 들기라도 하면 인간사회는 실제로 누구부터 제거할 것인가를 고민했다. 끔찍한 일이지만, 일차적으로 노인들이 살해되었다. 노동생산성이 없는 노인들은 알아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많았다. 우리에게 전설로 전해 내려오는 ‘고려장’, 곧 노령의 부모를 산 채로 매장하였다는 풍습은 노인살해의 한 형태였다고 볼 수 있다.(이런 풍습의 존재는 조선왕조실록에도 언급되어 있어 신빙성이 높다)
노인층을 제거하였음에도 집단의 존속이 어려우면, 그 다음은 유아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다. 많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대사회에서는 15-30퍼센트에 해당하는 갓난아이들이 어머니의 손에 목숨을 잃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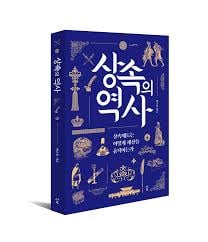
특히 여아의 살해가 심했다. 그리하여 고대 중국사회에서는 혼인 적령기의 여성이 많이 부족했다. 그런데 남성과 여성의 성비가 더욱 극단적으로 불균형했던 사회는 티베트였다.
기후와 지리적 조건이 유난히 열악하였기 때문에, 티베트에서는 여아살해가 보편적 사회현상이었다. 상속에 관해 조사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차마 상상할 수도 없었던 다양한 풍습과 마주치게 된다.
※출처: 백승종, <<상속의 역사>>(사우, 2018; 교보문고 및 세계일보가 공동 선정한 올해의 책)
사족:
상속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난한 "나"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재물의 축복을 받는데, "나"는 상속에서 배제된다면 어떨까요. "나"야말로 상속의 부정적인 영향을 심하게 받는 셈이지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으니까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 "비혼 인구"가 급속히 늘어나는 것도, 인구증가율이 크게 둔화된 것도 상속제도의 부정적인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높은 상속세율을 명기하고 있으나, 부자들은 그물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갑니다. 재벌 중에서 상속세를 제대로 낸 이는 오뚜기식품과 유한양행 정도일 것입니다.
"내"가 받는 혜택이 당연한 사람의 눈에는 남이 받는 불이익이 전혀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형태의 상속이 공정한지요? 잠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백승종(역사학자, 전 서강대 사학과 교수, 현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겸임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