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종의 '역사칼럼'

왕은 어려서부터 책을 즐겨 읽었다. 널리 알려진 사실인데, 그는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공부를 하였을까. 내가 보기에는 다음의 네 가지특징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첫째, 왕은 모든 공부를 정밀하게 했다. 어느 날 경연에서 [시경]의 시월 편에 일식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다. 왕은 권근이 저술한 [삼국사략(동국사략)]을 읽을 때 자신이 느낀 점을 말하며 “신라의 역사책에는 일식이 언급되어 있으나 백제 쪽 기록에는 보이지 않기도 하고, 그와 반대되는 경우도 많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지었다. “사관의 기록이 고르지 않아 때로는 세밀했으나 때로는 너무 소략했다.” (세종 6년 11월 4일) 이렇듯, 세종은 어떤 책을 읽든지 허투루 대하는 법이 없었다.
둘째, 신하와 토론을 통해 왕은 폭넓은 지식을 쌓았다. 그가 특히 역사에 밝았음은 앞에서 이미 언급했다. [자치통감]의 속편을 강독하다가 마침 송나라 태종이 잔치를 사흘 동안 베풀었다는 대목이 나왔다. 그러자 왕은 이렇게 논평했다. “송 태종은 어진 임금이었으나 공치사도 하였고 희롱하기를 좋아했다. 제왕으로서 차마 할 일이 아니었다.”(세종 12년 11월 18일)
배석한 정인지가 동의를 표하면서 송 태종이 시 창작과 낚시가 취미였다고 보탰다. 이에 세종은 송 태종에게 간언한 사람은 없었는지 물었다. 정인지는 그 당시에 유행한 시 한 편이 있다며 즉석에서 외웠다. “꾀꼬리는 임금의 수레 소리에 놀라 꽃 속으로 숨고, 물고기는 임금 얼굴이 무서워 낚시에 걸리기 어렵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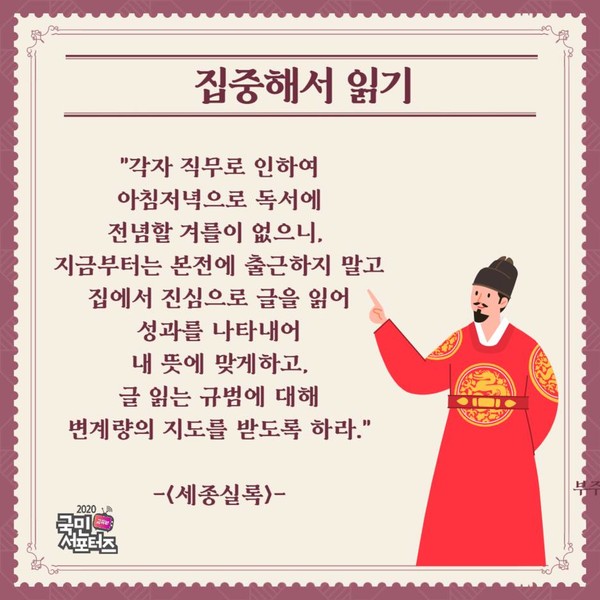
세종은 웃으며 그 시의 작자를 물었다. 정위(丁謂)가 지었다고 정인지가 대답하자, 왕이 이렇게 논평했다. “정위가 시는 뛰어났으나 마음씨가 옳지 못하였다.” 과연 정위는 교활하기로 유명해 많은 정치적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었다. 세종은 그런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었다.
셋째, 항상 주밀하게 공부한 결과이겠으나, 왕의 통찰력이 갈수록 깊어졌다. 한번은 송나라의 주희가 편찬한 [명신언행록(名臣言行錄)]을 읽을 때였다. 사마광이 맹자를 심하게 비판하는 대목이 나오자, 왕이 자신의 의견을 말했다. “온공(사마광)은 성품이 맑고 아름다웠다. 그러나 맹자는 기상이 높고 엄정해 서로 기질이 어울리지 않았다. 그런 차이로 온공이 맹자를 존중하지 못했다.”
경연관 정창손이 왕에게 동의하며 설명을 추가했다. “온공은 맹자의 글을 사서(四書)에서 제외하려고 했습니다.”(세종 16년 7월 8일) 이런 예화에 드러나듯, 세종은 유교 사상이 역사적으로 변천한 내력은 물론이고 이름난 학자들의 개인적 취향도 정확히 이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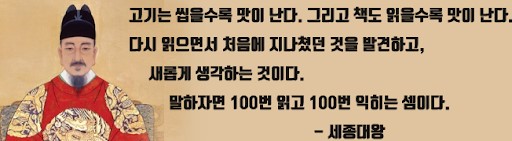
넷째, 왕은 현안이 있으면 우선 책에서 답을 발견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과거의 지식에 얽매이지는 않았다. 세종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부분일 것이다. 크고 작은 현안이 있을 때마다 왕은 고전을 널리 조사했다. 그래도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신중히 결정했다. 책을 중시하면서도 거기에 얽매지 않는 점, 이것이 그를 성공적인 지도자로 만들었을 것이다.
우리 눈에는 사소한 문제지만 그 당시에는 아주 중요한 문제도 있었다. 제사를 앞두고 재계를 하는데 그때 술을 마시는 것이 옳은가 하는 문제였다. 그 당시 조선의 관계 문헌에는 술을 지나치게 많이 마시지 않으면 무방하다고 했다. 이 때문에 재계 중 술을 과도하게 마셔서 실수하는 관리들이 많았다. 세종은 중국의 사례를 충분히 조사했고, 그 결과 재계하는 3일 동안에는 자극성이 강한 식물이나 술을 마시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세종 27년 2월 7일)
그런데 신하들의 의견은 찬반으로 갈렸다. 왕은 집현전 학사들에게 부탁해 고전의 사례를 철저히 분석해서 보고하도록 했다. [논어]의 향당 편과 그에 관한 주희의 주석에서는 술을 마시거나 냄새나는 식물을 먹지 말라고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다른 문헌에는 문란할 정도로 마시지 않으면 된다고 했다. 그래서 금주 논의는 원점으로 회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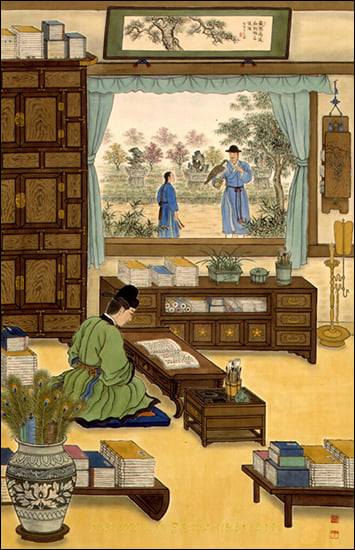
보름가량 세종은 이 문제를 다시 궁리한 끝에 결론을 내고 예조에 이렇게 명했다. “앞으로 재계할 때는 사냥해도 안 되며, 잔치의 참여도 금한다. 형벌을 주는 일에 관여해도 안 되고, 가축을 도살하거나 문병도 삼간다. 매운맛이 강한 식물을 먹는 일이며, 술 마시는 행위는 모두 금지한다.
단 예외적으로, 새벽에 1~2잔 마시는 정도는 허용한다.” (세종 27년 2월 24일) 그동안 어떤 절차를 거쳐서 왕이 이러한 결론에 이르렀는지 신하들이 잘 알았으므로, 감히 이론을 제기하지 못했다.
세종의 공부는 출세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도, 명예를 얻기 위한 수단도 아니었다. 조선의 왕으로서 백성의 근심을 덜고 그들이 평화롭게 서로 어울려 살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공부였다.
나같은 평범한 시민의 공부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라서 세종의 공부법이 과연 오늘의 시민에게도 도움이 될지 확신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나 조금 더 생각해보면 왜,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왕의 공부법은 우리가 세상과 사물에 관한 통찰력을 기르고, 당면한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상당한 시시점을 제공하고 있다.
/백승종(역사학자, 전 서강대 사학과 교수, 현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겸임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