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구의 '생각 줍기'

‘금시조(金翅鳥)’하면 소설가 이문열 선생의 소설 ‘금시조’와 이 소설을 1983년 1월 초에 TV문학관에서 드라마로 제작하며 방영함으로써 우리에게 잘 알려진 새입니다. 그러나 소설 속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주인공도 사찰에 잠시 머물면서 사찰 벽화에 그려진 ‘금시조’를 발견하면서 처음으로 금시조를 알았던 것처럼 금시조는 불가의 경전(화엄경과 잡아함경 등)에 나오는 천상의 새입니다.
초기 경전인 잡아함경에 보면 하늘의 왕인 제석천왕이 자신의 군사들이 모는 수레가 금시조 새끼의 둥지를 밟아 죽일까봐 걱정이 되어 적에게 죽을 위험을 무릅쓰고도 군사를 되돌릴 정도로 아꼈던 새로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화엄경에서는 인도의 신화에 나오는 상상의 큰 새로 ‘가루라(迦樓羅)’라고 음역(音譯)한 이름으로 나옵니다.

경전에서 가루라는 용을 잡아먹을 정도의 큰 힘으로 모든 일체 중생을 잘 구호하여 열반의 저 언덕에 이르게 한다는 선한 새로 나옵니다. 저도 직접 금시조 벽화를 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찰에서 벽화로 금시조를 그리지 않은 이유는 대부분의 사찰에는 불법(佛法)을 수호하는 용(龍)의 조각상이 있는데 거기에다 용(龍)을 잡아먹은 금시조를 벽화로 그리거나 조각상으로 만들어 놓게 되면 자기모순에 빠지게 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용의 벽화나 용의 조각상이 없는 사찰에는 금시조를 벽화를 그리거니 금시조 조각상을 지붕 위에 설치하는 것 같습니다. 삼각산 아래 도봉사란 사찰에는 용의 조각상으로 대웅전을 장식한 반면, 그 아래에 있는 능원사란 사찰은 지붕 위 양 쪽 난간에 금시조 상을 올려놓았습니다. 금시조가 있는 사찰에는 또한 전설상의 새인 봉황새 조각상도 같이 설치하는 걸 보았습니다.

능원사 용화전 지붕의 용마루 양쪽 머리에 있는 금시조(金翅鳥) 상은 동자승을 태우고 용을 부리는 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새는 매우 커서 한번 날개를 펴면 두 날개의 길이가 수백 만리이고 용을 잡아먹고 산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많은 분들이 장자(莊子)에 나오는 저 먼 북쪽 깊고 어두운 바다에 ‘곤(鯤)’이라는 커다란 물고기가 사는데, 이 물고기가 새로 변하여 하늘로 솟구쳐 날아오르면 ‘대붕(大鵬)’이라는 새가 된다고 나오는 장면을 연상하실 겁니다.
대붕이라는 새도 너무 커서 그 크기가 수천 리이고, 대붕이 되어 날아오르는 높이만 해도 구만 리나 된다고 하니 금시조가 생소하시면 비슷한 개념의 중국 전설상의 새 '대붕'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설 속에서 금시조가 등장하는 이유는 스승인 석담 선생이 제자인 고죽에게 서예를 배울 때는 "금시조가 날개로 바닷물을 가르고, 코끼리가 육중한 발로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은 치밀하고 투철한 기세로 임하라는 ‘금시벽해 향상도하(金翅劈海 香象渡河)’라는 가르침을 글로 써주면서 금시조가 등장하게 됩니다.

소설 ‘금시조’는 기예(技藝)는 능하나 도(道)에는 이르지 못한 한 불행한 예술가의 생애를 통해 지고지순의 예술을 성취하려는 고집스럽고 신비스런 인간상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예술에 대해 서로 반대되는 견해를 가진 스승과 제자가 갈등을 통해 펼치는 매죽(梅竹) 논쟁과 예도(藝道) 논쟁으로 서화가 예(禮)이냐 법(法)이냐 도(道)이냐로 열띤 토론을 전개하는가 하면 당시 촬영을 위해 다른 작가들의 동양화 40점 중 20점을 실제로 불태우는 등 화제가 많은 작품으로 유명세를 탔습니다.
소설 ‘금시조’는 대구 출신의 걸출한 서화가인 석재(石齋) 서병오(徐丙五) 선생과 그의 제자 죽농(竹農) 서동균이란 실제로 존재했던 두 작가의 실제 활동을 모티프로 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설 속의 내용과 같이 제자인 죽농이 실제로 스승인 석재 선생이 돌아가셨을 때 관(棺)의 명정인 ‘관상명정(棺上銘旌)’을 쓴 사실이나, 제자인 죽농이 말년에 초, 중년에 남발한 자신의 작품들을 대부분 찾아내어 모두 불살라 없앴다는 사실들을 보면 비록 허구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소설이긴 하나, 소설의 소재는 실존 인물의 삶에서 취한 작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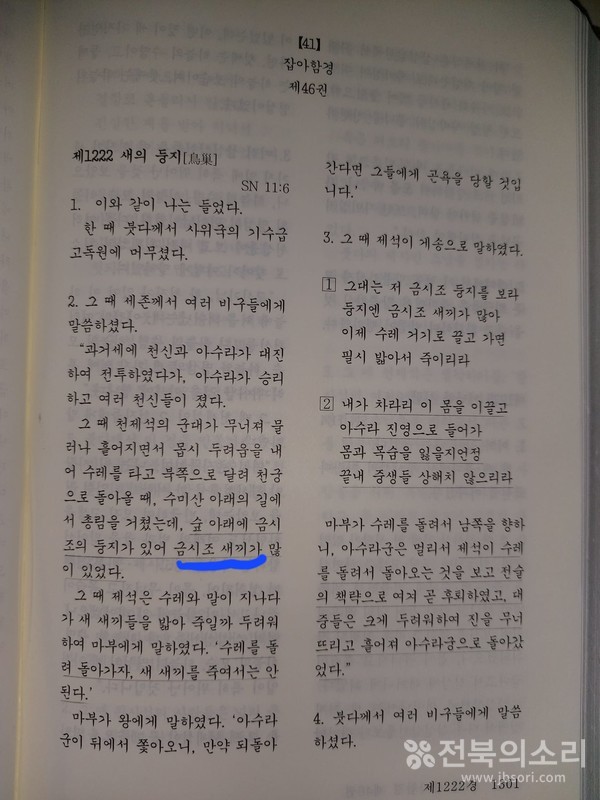
그렇기 때문에 저는 TV문학관에서도 소설 속의 인물들이 활동했던 대구지역에서 촬영을 했어야 하는데, 드라마 속에서 주인공이 서예작품을 매매하는 표구사에 들려 자신의 작품을 수거하기 위해 방문하는데 전주 택시회사의 택시를 타고 주변 간판에도 전주라는 지역이 뚜렷하게 나오도록 일부러 그렇게 촬영을 한 느낌마저 듭니다.
그래서 저는 TV문학관 제작 연출가 선생이 '전주 출신'이라 그랬는가 하고 알아보니 금시조를 연출한 PD는 '대구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왜 전주에서 촬영을 하고, 전주라는 지역 명이 나오도록 촬영을 했을까 궁금한 점이 남아 있습니다.
/글·사진: 이화구(CPA 국제공인회계사·임실문협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