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만의 명언 에세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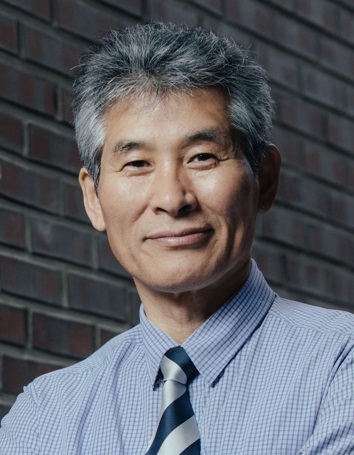
“과학적 정신은 경험이 신념에 위배되는 순간, 언제라도 대량의 신념을 전부 버릴 각오를 하라고 인간에게 요구한다.” 실용주의의 아버지로 불리는 미국 철학자 찰스 샌더스 퍼스(Charles Sanders Peirce, 1839~1914)의 말이다.
그러나 그런 일은 실제로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독일 철학자 니체(Friedrich Wilhelm Nietzsche, 1844~1900)가 그 이유를 간단히 설명했다. “신념은 감옥이다.” 그는 “강한 신념이야말로 거짓보다 더 위험한 진리의 적이다”고 했다. 이탈리아 철학자 알베르토 토스카노(Alberto Toscano)의 해설에 따르면, “니체에게 있어 진정 위대한 지성을 추동하는 힘은 믿음이 아니라, 어떤 하나의 주어진 진리에 대한 헌신에 묶이지 않은 채 가치를 제출하고 파괴할 자유를 표현하는 거대한 정열이다.”
이데올로기의 화신
영국의 정치사상가 이사야 벌린(Isaiah Berlin, 1909~1997)은 1958년 ‘자유의 두 가지 개념’이라는 강연에서 자유를 ‘소극적 자유(negative freedom)’와 ‘적극적 자유(positive freedom)’로 구분했다. 소극적 자유는 남의 간섭과 방해를 받지 않고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 자유이며, 적극적 자유는 공동체 참여를 통해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벌린은 소극적 자유를 진정한 자유로 보았으며, 적극적 자유는 가치에 관한 일원론적 관점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위험하다고 보았다. 그래서 신념에 대해 부정적인 자세를 취한 그는 “거창한 역사적 이상의 제단에 개인들을 희생한 책임이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신념이다”고 했다. 이에 영국 철학자 조노선 색스(Jonathan Sacks, 1948~)는 “나와 신앙(혹은 인종이나 이데올로기)이 다른 자들은 나와 똑같은 인간이 아니라는 신념 말이다”고 맞장구를 쳤다.
“그들은 신념으로 무장된 사람들이다....아무런 의심 없이 특정한 신조를 믿으며,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 신조를 실천에 옮긴다. 그들은 인간이기를 포기한 자들이며 그 대신 살아 숨쉬는 특정한 신념 또는 이데올로기의 화신이다.”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 J. 윌리엄 풀브라이트(J. William Fulbright, 1905~1995)가 [권력의 오만(The Arrogance of Power)](1966)에서 워싱턴의 권력자들에 대해 한 말이다.
국가 경영에 이데올로기가 개입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본 풀브라이트는 “그동안 세계는 인류를 재생시키겠다는 고상한 뜻을 가진 사람들의 십자군적 행태에 의해 온갖 풍상을 겪을 만큼 겪었다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세계의 악을 감시하고, 독재자들을 무찌르며, 인류를 부유하고 행복하고 자유롭게 만들 임무를 지녔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사람들은 (그 누구든) 세계에 평화를 가져오기보다는 자신이 도우려는 사람들에게 온갖 불행을, 그리고 스스로에게는 파멸을 초래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듯 신념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회의적인 자세를 취하는 사람들은 사회심리학자 대릴 벰(Daryl Bem, 1938~)의 ‘자기지각이론(self-perception theory)’을 환영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 인간은 타인의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을 규정짓는 것처럼 자신의 행동을 보고 스스로를 규정하는데, 이게 바로 ‘자기지각(self-perception)’이다.
자기지각이론과 신념
벰이 연구를 위해 주목한 사건은 1954년 5월 17일 연방대법원의 브라운 사건(Brown v. Board of Education of Topeka) 판결이었다. 이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흑인에 대한 그간의 ‘분리 평등’ 원칙을 뒤집고 교육시설의 분리에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 10여년전인 1942년에 실시된 조사 자료에 따르면, 학교통합정책, 주거통합정책, 대중교통 통합정책에 찬성한 백인들의 비율은 각각 30퍼센트, 35퍼센트, 44퍼센트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 판결 후 2년 뒤인 1956년 자료에서는 그 비율이 49퍼센트, 51퍼센트, 60퍼센트로 크게 증가했다.
이 변화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이 물음에 이끌려 물리학도였던 벰은 자신의 전공을 사회심리학으로 바꾸었다. 그가 1967년부터 1970년대 초반에 걸쳐 발전시킨 자기지각 이론에 따르면, 우리의 많은 태도들이 자신의 행동과 또는 행동이 일어나는 상황들에 대한 우리의 지각들에 근거한 것이다. 특별한 생각이나 계획없이 어떤 행위를 한다면 행위자는 그 행위를 바탕으로 자신의 내적 특성을 추리해낸다는 것이다.
신념이 행동을 형성하는가, 아니면 행동이 신념을 형성하는가? 꼭 어느 하나를 택할 필요는 없다. 신념이 행동을 형성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그 어떤 구체적인 신념이 없을 때 우리는 자신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모르면서 어떤 행동을 자주 하게 되며, 이런 경우 자신이 한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이미 저지른 행동에 맞게 신념을 세운다는 게 자기지각이론의 요지다.
자기지각이론을 수용하면 자신의 신념에 대해 상대적 타당성만 인정하면서 다른 사람의 신념에 대한 포용이나 타협의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 소설가 김훈은 십수년 전 어느 강연에서 “사실 위에 정의를 세울 수는 있어도 정의 위에 사실을 세울 도리는 없다. 나는 신념이 가득 찬 자들보다는 의심이 가득 찬 자들을 신뢰한다”고 했다. 그가 다음과 같이 지적한 우리 정치 언어의 현실을 살펴 보면 이 말에 수긍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사회의 언어가 의견과 사실을 구분하는 능력을 상실한 지 오래다. 의견을 사실처럼 말하고 사실을 의견처럼 말하기 때문에 언어가 소통이 아니라 단절로 이르게 된다. 이것은 지배적 언론이나 담론들이 당파성에 매몰돼 그것을 정의, 신념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우리 시대 언어의 모습은 돌처럼 굳어지고 완강해 무기를 닮아가고 있다.”
/강준만(전북대 신문방송학과 명예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