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만의 명언 에세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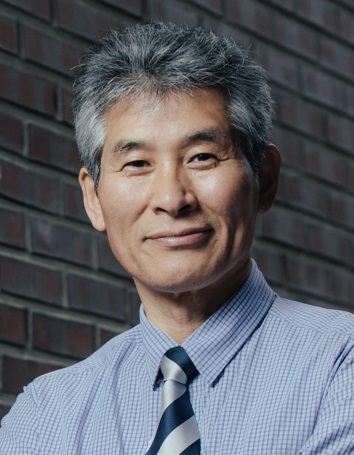
“법은 공유지에서 거위를 훔친 불운한 도둑을 잡아 가둔다. 하지만 거위에게서 공유지를 훔친 더 큰 도둑은 활개치며 다닌다.” 서양의 옛 민요다. ‘월스트리트의 무법자’로 불린 미국의 철도 개발업자이자 금융가인 대니얼 드루(Daniel Drew, 1797~1879)도 약자에게만 강하고 강자에겐 약한 법의 속성에 대해 이런 말을 남겼다. “법은 거미줄과 같아서 파리와 작은 곤충을 잡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덩치 큰 호박벌은 그냥 뚫고 지나가버린다.”
미국 연방대법관 루이스 브랜다이스(Louis D. Brandeis, 1856~1941)는 “법에 대한 존경을 원한다면 먼저 법을 존경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한다”고 했고, 미국 정치가 휴버트 험프리(Hubert H. Humphrey, 1911~1978)는 “우리가 누리는 자유의 과실을 공유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과 질서에 대한 존중이 생겨나는 걸 기대할 수는 없다”고 했다.
법에 대한 존경과 존중이 없는 현실에 대한 개탄처럼 들린다. 그렇다. 그게 당시의 현실이었고, 오늘날에도 크게 다를 건 없다. 미국의 법정 시스템에 대해 비판적인 미국 하와이대 사회학 교수 데이비드 존슨(David Johnson)은 “돈 많은 피고가 가난한 검사를 제압하는 미국의 사법제도는 본받을 게 거의 없다”고 했다. 그는 “미국식 당사자주의 소송구조(Adversary System)는 피고인의 인권을 획기적으로 보호하는 제도로 인식되어 오지 않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했다.
로스쿨의 실상
“당사자주의의 본질은 피고인과 검사가 전쟁 또는 스포츠게임에서와 같이 ‘이기기 위해’ 자유롭게 공격과 방어를 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실체적 진실은 그 싸움의 결과 ‘부수적으로’ 드러난다는 것이다. 그러나 결과는 그렇지 않다. 돈이 많은 피고인은 좋은 무기(변호인과 증거 등)를 보유해 가난한 국가(검사)를 제압한다. 물론 돈이 없는 피고인은 그 반대다. 돈의 위력이 너무 세고 진실은 무의미하다.”
법조인을 양성하는 로스쿨이 졸업생들의 취업률을 조작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는 건 무엇을 말하는가? 법의 영역이 속된 말로 ‘돈 놓고 돈 먹기’식의 노름판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건 아닐까? 미국 로스쿨 교수 브라이언 타마나하(Brian Z. Tamanaha)는 [로스쿨은 끝났다: 어느 명문 로스쿨 교수의 양심선언](2012)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로스쿨 교수들이 잘 알고 있듯이, 지망생들은 ‘졸업 후 9개월 내에 90% 취업’이라는 말을 ‘변호사는 수입이 좋은 직업’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 로스쿨은 최고의 직업을 마케팅하고 있는 것이다. 로스쿨 취업률을 꼼꼼히 조사해본 회의적인 지망생이 있다면, 뭔가 계산이 틀리다는 것을 눈치챘을 것이다. 많은 로스쿨들이 발표하는 졸업생 취업률은 그들의 변호사 시험 합격률보다 높다. 이는 졸업생들이 구한 직업이 변호사가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로스쿨의 이런 ‘사기 행각’에 대해 2011년 10월 상원의 조사가 이루어진 것과 관련, 타마나하는 이렇게 말한다. “졸업생들은 20여개 블로그에서 ‘로스쿨 사기행각’을 폭로하는 이른바 ‘사기 폭로 블로그(scamblog)’ 운동으로 로스쿨에 연일 거친 공격을 해댔다. 이들은 독자들을 향해 로스쿨이 취업률 통계를 속이고 있으며, 많은 졸업생들이 엄청난 빚을 진 채 직장도 못 구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로스쿨 교수들과 학장들을 불량품을 팔아 돈을 버는 악덕업자로 묘사했다.” 학생들에게 법을 가르치는 로스쿨 교수들과 학장들마저 그럴진대, 법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한국의 로스쿨은 어떤가? 로스쿨은 ‘사법시험 낭인’을 없애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취지로 지난 2008년 출범했지만 본래 취지와 달리 최근에는 ‘돈 먹는 하마’가 됐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돈 먹는 하마’ 로스쿨, 학비 4000만원 쓰고 또 학원 간다”라는 제목의 [조선일보](2022년 8월 2일) 기사에 소개된 실상을 좀 살펴보도록 하자.
법조인의 소양
2021년 기준 전국 25개 로스쿨 평균 연간 등록금은 1425만원에 육박한다. 등록금이 가장 비싼 곳은 고려대(1950만원)였고, 입학금을 포함하면 연세대(2150만원)가 가장 비쌌다. 반면 로스쿨 학생 중 학비의 일부라도 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최근 수년간 전체의 30~40% 안팎에 그치고 있다. 로스쿨 학위 취득 후 5년 내 변호사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더 이상 시험을 보지 못하게 돼 이른바 ‘오(五)탈자’가 된다. 하지만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해마다 낮아지는 등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 학원 등 사교육에 의지하는 학생들이 갈수록 늘고, 이들의 경제적 부담 역시 커지고 있다 하니, 도대체 로스쿨을 왜 만들었는지 국정조사나 청문회라도 열어야 하는 게 아닌가?
로스쿨 입학 후 한 학기 동안 인터넷 강의로 90만원짜리 민법 강의, 40만원짜리 형법 강의를 드는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지방 로스쿨 학생들은 방학 때 서울로 ‘원정 수업’을 들으러 가기도 한다. 부산대 로스쿨생 김모(26)씨는 “방학 때 같은 학교 동기들의 3분의 1을 서울 신림동 학원에서 만난다”며 “본가가 서울인 학생도 있지만 지방에 거주하는 이들의 경우 인근 고시원을 구해 방학 내내 지낸다”고 했다. 이런 ‘사교육’이 일반적인 일이 되면서 ‘경제력’이 법조인의 기본 소양이라는 자조까지 나온다고 한다.
프랑스 계몽 사상가 장 작 루소(Jean Jacques Rousseau, 1712~1778)는 [사회계약론](1762)에서 “법은 재산을 가진 사람에게는 아주 좋은 것이고 재산이 없는 사람에게는 아주 나쁜 것이다”고 했다. 우리가 지난 260년간 아무런 진보도 없이 그 말을 다시 되뇌며 어린 아이들에게도 가르쳐야 한다는 건 너무 비참하지 않은가?
/강준만(전북대 신문방송학과 명예교수)

